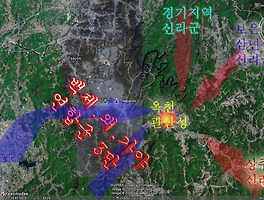한가위별책 - 백제 깨어나다 <한겨레21 2010년 9월호 특집> 
■ [민삿갓의 팔도기행] 공주·부여-백제의 찬란했던 꿈, 그 흔적을 찾아서 월간 산 [491호] 2010.09월호 ■ 백제의 고도 고나마루 (무령왕릉 발굴상황과 무령왕의 즉위 전후의 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
의자왕은 승리할 수 있었다 치밀한 전술 대응…승기 잡았지만 내부 반란에 당해 삼천궁녀는 사서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 조선 중기 시인 민제인의 ‘백마강부’란 시에 문학적인 수식어로 처음 등장할 뿐. 그리고 일제시대 대중가요 <백마강>의 애절한 곡조가 백제 망국과 묘하게 어우러져 대중에게 역사로 각인된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전성기 때 느닷없이 망한 국가는 백제밖에 없다. 요절한 국가! 백제, 그리고 역사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의자왕! 이제 ‘삼천궁녀’와 ‘호색한’으로 왜곡된 의자왕을 복권시켜야 하지 않을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왕은 누굴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광활한 만주 벌판을 확보한 광개토대왕이 아닐까? 그런데 이 두 대왕에 버금가는 인지도를 자랑하는 왕이 있다.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이다! 의자왕에게는 '대왕'이란 수식어는 없지만 '삼천궁녀'라는 수식어가 있다! 삼천궁녀와 의자왕! 삼천궁녀는 사서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 백제가 멸망하고도 1천 년이 다 된 조선 중기 시인 민제인의 ‘백마강부’란 시에 문학적인 수식어로 처음 등장할 뿐. 그리고 일제시대 대중가요 <백마강>의 애절한 곡조가 식민지 조선의 비애와 백제 망국이 묘하게 어우러져 대중에게 역사로 각인된 것이다. 삼천궁녀는 없었고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어쩌랴? 삼천궁녀의 허구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의자왕은 당시 일흔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음을 상기해도 우리 머릿속엔 삼천궁녀의 치마폭에 휩싸여 방탕하게 놀고 있는 장년의 의자왕이 그려질 뿐! 그것은 망국의 왕이 안아야 할 숙명이었다. 우리 역사에서 660년 6월21일부터 7월18일까지는 가장 처절한 한 달이었다. 서해는 백제에 천연의 요새다. 서해를 건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틀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군수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660년 당시 중국의 국력으로 대군이 바다를 건너 지속적인 군수품 보급 속에 백제 정벌을 감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버렸다. 당나라군이 산둥반도를 출발해 인천의 덕적도에 도착한 것은 660년 6월21일이었다. 5월26일 경주를 출발한 신라군 5만 명이 북쪽으로 진군해 지금의 경기도 이천에 도착한 것이 6월18일. 신라의 대군이 북상하는 걸 백제가 몰랐을 리 없다. 그러나 신라 경내에서 북상하는 경로는 당연히 고구려를 공격할 진군로였다. 비상경계령 속에 백제군은 신라군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사비 방어전은 최선책 당군은 6월21일 신라 함선 100척이 싣고 온 군수품을 보급받는다. 아무리 빨라야 6월23일께야 백제는 나당 연합군의 공격 목표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군과 먼저 싸우자는 주장과 신라군과 먼저 싸우자는 주장이 대립하고, 의자왕은 결론을 못 내린다. 이 대책회의는 두고두고 의자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용된다. 그러나 의자왕의 주저함은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신라나 백제가 동원 가능한 군대는 최대 5만 명이었고 실제 전투 병력은 3만 명 정도였다. 백제군 5만 명은 전통적인 5방 방어 체계에 따라 지방에 주둔했다. 당군이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는 상태였고, 동서 양쪽으로 진격하는 나당 연합군의 양동전도 백제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기 곤란하게 했다. 군대를 나누자니 그나마 부족한 전력이 더 부족해지고, 한쪽으로 집중하자니 다른 쪽에 치명적인 허점을 보이게 된다. 평생을 전장에서 단련된 백전노장 의자왕도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나당 연합군은 예측을 뛰어넘는 엄청난 속도로 진격하고 있었다. 당군은 뱃길로 하루면 백제의 어디든 상륙할 수 있었고, 신라군은 매일 20km를 강행군하고 있었다. 인민군이 한국전 때 서울에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오던 속도에 맞먹는 진군 속도였다. 삼국시대의 보편적 전술은 거점성 점령 뒤 주변을 평정하고 차근차근 진군하는 것이었다. 성을 두고 전진했다가는 보급로가 차단돼 싸우기도 전에 굶어 죽는다. 그러나 신라군은 고대 전투의 기본을 무시해버렸다. 수나라 100만 대군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요동에서 평양까지 늘어선 성을 도저히 뚫을 수 없었다. 그러자 별동대 30만 명으로 수도 평양을 직공하다 전원 몰살당한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신라 5만 대군은 수나라 별동대가 사용한 전술을 구사했다. 이 전쟁의 목표는 영토 확장이 아니라 백제 멸망이었기 때문에 백제군의 중간 방어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비성으로 내달리는 전술을 택한다. 짧은 시간 안에 의자왕을 체포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전술이었지만 당군 13만 명이 있기에 해볼 만한 작전이었다. 나당 연합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의자왕은 신라군 없이는 당군이 섣불리 싸우지 못한다는 것을 간파한다. 지방에 있는 5방군이 사비로 집결할 때까지 신라군을 사비 외곽에 묶어두기만 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의자왕은 계백의 5천 결사대에 신라군 저지 임무를 맡긴다. 서쪽의 13만 당군 때문에 더 이상 빼내는 것은 위험했다. 계백은 백제가 이기든 지든 자신들은 신라군과의 전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황산벌에 진을 친다. 소수의 병력이 들판에서 대군을 맞이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지만 계백은 고육지책을 사용한 것이다. 10 대 1, 절대 열세지만 백제군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다. 신라군의 진군을 막기만 하면 됐기에 계백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황산벌 전투 재현 모습. 세계 대백제전 조직위원회 제공 비장미 넘친 황산벌 전투 660년 7월9일부터 10일까지 황산벌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나 5만 신라군은 죽기로 버티는 백제 5천 결사대의 철벽 방어선을 뚫을 수 없었다. 5천 결사대의 처절한 투혼은 신라군의 파상 공세를 네 번이나 막아냈다. 이렇게 되자 7월10일 사비 남에서 당군을 만나기로 한 김유신은 다급해졌다. 김유신은 어린 관창을 사지로 몰아넣어 신라군을 충동시키는 극약 처방을 내린다. 신라군은 진법이고 뭐고 필요 없이 일시에 5만 대군으로 백제군을 덮쳤을 것이다. 말 그대로 짓밟고 진군하지 않았을까? 이 전술은 아군의 피해도 막대하기 때문에 가장 하책이지만 당시 신라군의 처지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황산벌 전투는 우리 역사에서 극적인 긴장도가 가장 높고 장엄한 비장미가 넘친다. 논산시에서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대규모 황산벌 전투를 공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대단히 재미있고 스케일도 있는 공연이었다. 잘만 다듬으면 세계적인 공연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백제 멸망 당시 황산벌 전투보다 더 큰 전투는 당군과의 전투였다. 계백의 5천 결사대는 백제 주력군은 아니었다. 의자왕은 주력군을 13만 당군 쪽으로 배치한다. 황산벌에서 전투가 벌어진 7월9일 당군은 금강 하구의 기벌포로 상륙했다. 최전방에는 버드나무로 짠 자리를 펼쳐든 신라수군이 앞장섰다. 당군은 백제군의 저지를 뚫고 버들자리를 딛고 갯벌을 통과해 상륙에 성공한다. 7월10일 백제군은 사비 남쪽에서 다시 한번 당군과 결전을 벌이지만 1만의 사상자를 내고 패퇴한다. 사실상 사비 방어선이 무너진 것이다. 7월11일 신라군이 당군과 합류하고 7월12일 사비의 외곽성인 나성이 무너지고 왕궁이 포위당한다. 결국 개전 5일째인 7월13일 의자왕은 사비 방어전을 포기하고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지휘부를 옮겨 2차 방어선을 구축한다. 그날 밤 사비도성은 나당 연합군에 함락됐다. 웅진성에 2차 방어선 구축 대규모 나당 연합군을 방어하기엔 웅진성은 효과적이었다. 지금 공주의 공산성인 웅진성은 험준한 벼랑과 백마강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농성전에는 적격이다. 또 예산의 임존성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도 유리한 상황이다. 임존성은 훗날 백제 부흥군이 나당 연합군과 3년 동안 싸울 때 마지막까지 버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의자왕은 웅진성에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임존성과 함께 나당 연합군을 견제하면서 전력이 보존돼 있는 지방군이 나당 연합군을 4면에서 포위해 공격해오기를 기다렸다. 지형지물에 익숙한 백제군이 나당 연합군을 분산시키고 유격전을 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다급해진 것은 오히려 나당 연합군이었다. 개전 5일 만에 사비도성을 함락했지만 연합군 지휘부는 의자왕을 놓치는 결정적인 실패를 했다. 의자왕은 18만 대군을 깊숙이 끌어들인 뒤 웅진으로 피해버린 것이다. 나당 연합군에 또 하나 큰 위협은 18만 대군의 식량이었다. 전투 중에 사비도성의 백제군 군량은 불타버렸다. 그런데 신라에서 오는 보급품은 동쪽 백제 국경의 산성들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도성을 목표로 신속히 진군한 탓에 산성에 농성 중인 백제 병력이 건재했고, 이들은 연합군의 보급 통로를 봉쇄한다. 실제 훗날 백제 부흥군이 이곳을 차단해 사비의 2만 명도 안 되는 당군이 식량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고, 이 보급로를 뚫기 위해 당군 1천 명이 공격에 나섰다가 전멸한 적이 있다. 18만 나당 연합군은 의자왕을 웅진성에 가두었지만 그들 역시 사비와 공주에 갇힌 신세가 돼가고 있었다. 이제 시간은 의자왕의 편이었다. 측근에 사로잡힌 의자왕의 자결 시도 의자왕이 웅진성에서 농성전을 이끌고 있을 때 웅진방어사령부의 실질적인 지휘관은 웅진방령 예식 장군이었다. 그런데 의자왕은 항전 10일째인 660년 7월18일 갑자기 항복하고 만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의자왕이 항복하는 상황에 대해 “의자왕 및 태자 효가 제 성주들과 함께 항복했다”(王及太子孝與諸城皆降)라고 기록하고 신라본기에는 “의자왕이 태자 및 웅진방령군을 거느리고 웅진성에서 나와 항복했다”(義慈率 太子及雄鎭方領軍等. 自雄津城來降)고 돼 있다. 그런데 <신당서>에는 그 대장 예식이 의자왕과 함께 항복했다(其大將植 又將義慈來降)고 했고 <삼국사기>보다 200년 앞선 945년에 편찬된 <구당서>에도 “그 대장 예식이 의자왕과 함께 항복했다”(其大將植 又將義慈來降)라고 기록했다. 특이하게도 의자왕이 항복하는 장면을 서술하는 데 <구당서> <신당서> 모두 의자왕이 주체가 아니라 부하인 예식이 주체로 돼 있다. 사서는 중요한 사람 중심으로 기록한다. 특히 왕이 관련된 기사라면 당연히 왕 중심으로 서술한다. <구당서> <신당서> 모두 왕 중심이 아니라 예식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은 예식이 뭔가 특별한 역할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구당서> 기록의 의자왕 항복 기사 바로 뒤 융의 기사를 보자. “其大將植 又將義慈來降 太子隆幷與諸城主皆同送款”(그 대장 예식이 의자왕과 함께 와서 항복했고 태자 융은 여러 성주들과 함께…)라고 태자 융이 주체로 기록돼 어색함이 없다. 그런데 민족사학자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의자왕의 항복 장면을 독특하게 서술했다. “웅진성의 수성대장이 왕을 잡아 항복하라 하매 왕이 자결을 시도했으나 동맥이 끊기지 않아… 당의 포로가 되어… 묶여 가니라….” 의자왕이 측근인 수성대장 예식에게 잡혔다? 신채호 선생의 말뜻은 무엇일까? ‘又將義慈來降’을 분석해보자. ‘又’는 또, ‘降’은 항복하다. 그러면 ‘將’만 남는다. 모든 상황은 將이라는 글자에 정확히 담겨 있다. 그 대장 예식이 또 의자왕을 將해와서 항복했다? 將은 무슨 뜻일까? 將자에는 명사로서 ‘장수’, 동사로서 ‘거느리다’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가 있다. 문장으로 봐서는 동사로 해석해야 한다. 예식이 의자왕을 데리고 와서 항복했다. 예식 장군이 의자왕을 데리고 가다? 왕을 데리고 가다? 무슨 뜻일까? 체포하다? 한문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중국 역사학자 바이근싱 산시대학 교수는 여기서 ‘데리고’는 ‘왕을 사로잡아서 당나라에 투항했다’는 뜻이라고 단언한다. 충격적인 해석이다. 당나라 대장군이 된 예식의 묘 발견 그런데 이 해석에 힘을 싣는 한 점의 묘지명이 2008년 중국 시안에서 발견됐다. 묘지명의 주인공은 대당좌위위대장군이란 정3품의 고위직을 지낸 예식진이었고, 할아버지 예다와 아버지 사선 모두 백제 최고 직위인 좌평을 지낸 유력 가문 출신이다. 백제 614년에 태어나 672년 58살의 나이로 사망한 예식진은 백제 웅천, 즉 현 충남 공주 출신이라고 기록돼 있다. 바로 이 예식진이 웅진의 그 대장 예식이다. 웅진 성주 예식 장군은 18만 대군의 공격 앞에 고민 끝에 의자왕을 압박해 당군에 항복하고 그 공로로 당나라에 들어가 대장군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의자왕의 허망한 항복의 이면에는 하극상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많은 국가가 망했지만 모두 국력이 쇠해 망했다. 그런데 백제만이 전성기 때 느닷없이 망해버렸다. 요절한 국가! 백제, 그리고 역사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의자왕! 예나 지금이나 전력이 비교되지 않는 국가 간의 전투는 일방적인 결과를 낳는다. 굳이 의자왕의 책임을 묻자면 대국인 당나라의 비위를 거스른 정도가 아닐까? 망국의 책임이면 족하다. 이제 ‘삼천궁녀’와 ‘호색한’으로 왜곡된 의자왕을 복권시켜야 하지 않을까? 류지열 한국방송 <역사 스페셜> PD <무령왕릉 발굴배치도>   (좌측) 윗쪽이 북쪽이며 머리는 남쪽을 향하고 있고 오른쪽이 왕이고 왼쪽이 왕비이다. |
백제 무령왕릉 (武寧王陵) 무령왕릉 (武寧王陵)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7번째 발견된 고분이며 백제 25대 무령왕(재위 501∼522)과 왕비의 무덤으로, 벽돌을 이용해서 만든 벽돌무덤(전축분)이다. 1971년 7월 7일 처음 발굴되었다. 발굴된 유물중 지석(誌石)은 삼국시대 고분 가운데 최초로 무덤에 묻힌 주인과 만든 시기를 확실히 밝혀주는 자료가 되고있으며, 국보로 지정된 금제관식, 금제뒤꽂이, 금제 심엽형이식(귀걸이), 지석, 석수, 청동신수경 등을 포함하여 총 2900여 점의 많은 유물이 출토 되었다. 무령왕릉의 구조 무령왕릉은 송산리 고분군(사적 13호)에 속해 있으며 총 7기의 무덤 중 7호분 무덤으로 무령왕릉은 송산리(宋山里) 제5, 6호분과 서로 봉토(封土)를 접하고 있다. 송산리 고분의 1~5호분은 깬돌을 쌓아 만든 반원 굴식 돌방무덤이며, 6호분과 무령왕릉은 굴식 벽돌무덤이다. 돌방무덤은 한성도읍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무덤 양식이며, 벽돌무덤은 6세기초 중국 남조 양(梁)나라로 부터 들여온 무덤양식이다. * 1~5호분 : 백제 굴식 돌방무덤 * 6호분, 무령왕릉(7호분) : 벽돌무덤 봉분의 윗부분은 지름 약 20m의 원형 구모양을 가지며 널방(墓室)의 바닥면에서 무덤 꼭대기까지 7.7m이다. 널방은 연화무늬 벽돌과 글자가 새겨진 벽돌 등으로 쌓여진 하나의 방으로 평면 4.2m×2.72m의 크기인데 북으로 축선(軸線)을 둔다. 천장은 아치 모양이며 바닥면으로부터의 최고값은 2.93m이다. 벽면에는 제6호분과 똑같은 모양의 소감(小龕)과 그 아래에 연꽃모양 창모양으로 된 것을 북쪽 벽에 1개 동·서벽에 각각 2개를 만들고 각 감내에는 등잔이 들어간다. 출토된 유물은 백제고분으로서 전례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화려하다.  5호분과 6호분 사이의 7호분이 무령왕릉  무령왕릉 현실 입구  무령왕릉 현실의 내부모습 무덤 양식 무령왕릉의 아치형으로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써 중국 남조에 속하는 남경을 수도로 한 양나라의 무덤의 양식과 유사하다. 중국 양서 백제전에 백제가 기술자와 화공들을 백제로 들여갔다는 기록도 있어 무덤의 축조에 양나라의 기술자들이 동참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왕릉 축조에는 모두 28종류 이상의 다양한 벽돌이 사용되었다. 발견된 벽돌에는 양나라 관청에서 만든 벽돌을 모방하여 만들었다라는 의미의 '양관와위사(梁官瓦爲師矣)'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남경에 있는 제가산 남조묘들과 무령왕릉의 양식이 매우 흡사하다. 무덤의 양식은 보수성이 강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데 무령왕릉은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서 무령왕시대에는 백제가 양나라와 긴밀하게 교류를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굴 과정 <발굴 경과> 1971년 7월 6일 송산리 5, 6호분의 배수로 공사중 우연히 벽돌무덤 1기가 발견되었다. 무덤입구는 벽돌과 백회로 빈틈없이 밀봉되어 있었고,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7월 7일 무덤의 아치형 입구를 발견하였다. 호우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므로 자정까지 배수로를 팠다. 7월 8일 날이 밝자 발굴을 다시 시작하여 오후 3시경 입구를 막는 벽돌의 바닥까지 발굴을 하였다. 위령제를 지낸 후 4시경에 입구를 막는 벽돌을 드러내자 널길의 중앙에서 돌짐승을 발견하였다. 무덤의 입구를 열었을 때 왕과 왕비의 지석 2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지석에는 백제 무령왕과 왕비가 돌아가셔서 이곳 대묘에 안장했다는 내용이 수려한 남조풍(南朝風) 해서체로 새겨져 있었다. 1442년 만에 무령왕과 왕비의 실존이 밝혀졌다.  1971년 발굴 당시의 모습 이후 발굴팀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왕릉의 발굴을 발표하였다. 이후 혼란 속에서 밤을 세워 유물을 수습하였다. 이와 함께 기자들에게 내부를 공개하면서 본래의 모습이 훼손되어 이후 성급한 발굴과 공개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호우로 인하여 8일 밤새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부분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밑에 한겨레21에서 상황을 잘 적어 놓았다.) <최초 무덤 내부 상황>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108종 2,906점이다. 연도에는 왕과 왕비의 지석(誌石) 2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그 위에 오수전 한 꾸러미가 얹혀 있었다. 지석 뒤에는 돌로 만든 짐승(石獸 : 석수) 모양이 남쪽을 향해 서 있었다.  묘실의 관을 올려 놓은 대위에는 왕과 왕비의 관을 만들었던 나무 조각이 가득 놓여 있었다. 목관의 판재들 밑에서는 왕과 왕비가 착용하였던 장신구와 몇 점의 부장유물이 출토되었다. 중요 장신구류로는 금제관식, 금제이식, 금은제 허리띠, 금동장신발, 은제팔지 등이 있고 왕의 허리에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봉문대도가 출토되었다. 그 밖에 왕과 왕비의 베개 및 발받침이 목관 안에 놓여 있었고 그 외에 중요 부장품으로는 청동거울 3면과 은제탁잔 등이 출토되었다.  발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두었다.  |
||
잊혀졌던 미래, 백제와의 낯선 만남 승자가 지워버린 패자의 역사… 알수록 빠져드는 매력 6세기 후반, 장기간 지속되던 중국의 분열이 끝났다. 남조와 북조, 유연과 고구려를 각기 중심축으로 삼았던 4강의 시대가 끝나고 유일 초강대국 수나라가 등장한 것이다. 4강 사이에서 세력 균형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던 고구려로서도 불가항력이었다. 이때부터 동아시아 사회는 대살육의 시대로 접어든다.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 그리고 당과 신라에 의한 백제와 고구려 멸망은 장기간 지속되던 세력 균형 상태가 깨진 결과였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자신의 칼로 살해하고 전쟁에 나간 계백, 중학생 나이밖에 안 된 아들 반굴에게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을 강요하는 아버지 김흠순(김유신의 아우), 적군의 칼에 잘려 말 안장에 매달려 돌아온 아들의 목에서 흐르는 피를 옷소매로 닦던 아버지 김품일. 이들의 비극은 당시 사람들이 처해 있던 현실이 얼마나 절박하고 그들의 선택이 또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영화로 희화화하거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애국주의 교육의 소재로 삼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광경이다. 삼국통일…의자왕과 삼천궁녀 ‘탄생’ 이 잔인한 살육의 시대에서 마지막 승자는 신라였다.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이들보다 100년 전에 이미 신라에 통합된 가야는 역사의 패자로 인식됐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삼국통일의 뒷면에는 이런 아픔이 스며 있다. 당시 관점에서 백제는 분명히 패자였다. 서기 660년 봄부터 백제의 도성 사비에서는 온갖 괴이한 일이 이어졌다. 백제의 멸망을 예고하는 사건들이었다. 왕도의 우물이 핏빛으로 바뀌는가 하면 귀신이 궁궐로 들어와 “백제는 망한다!”라고 외치는 등 수많은 기상이변과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 과연 이 해에 당과 신라의 대규모 연합군에 의해 백제는 맥없이 무너졌다. 성충과 흥수의 충성심도 계백 장군의 희생도 백제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도성은 불타고 왕릉은 도굴되고 백성들은 죽거나 노비로 끌려갔다. 의자왕은 충신을 멀리하고 주색을 탐한 결과 나라를 망하게 한 어리석은 왕으로 낙인찍혔다. 그리고 낙화암과 삼천궁녀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이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최후의 모습이다. 을지문덕과 연개소문으로 대표되는 고구려인의 강성함과 비장함, 김유신과 김춘추로 집약된 신라인의 호국정신과 비교할 때 백제의 이미지는 지극히 부정적이다. 게다가 고대 한국사 연구의 기초 자료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백제에 대한 내용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반 대중에게나 역사 연구자에게나 백제는 그다지 탐탁지 않은 존재였다.  » 무령왕릉 현실 무령왕릉, 백제의 새 발견 1971년 우연히 공주에서 무령왕 부부의 무덤이 전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면서 고구려·신라·가야와는 다른 백제 문화의 화려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1990년대에 풍납토성의 발굴 조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비로소 백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온조와 비류가 정착한 지점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이었고 이곳에서 백제사가 수백 년간 지속됐다는 당연한 사실은 공주와 부여만이 백제사의 무대라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2007년 창왕(위덕왕)이 먼저 죽은 아들을 위해 만든 왕흥사지 사리기가 발견됐고, 2009년에는 무왕과 선화 공주의 사연이 얽혀 있는 미륵사지에서 호화찬란한 귀금속 사리기가 발견됐다. 나약함과 무력함으로 인식되던 백제 문화의 전혀 다른 면모가 드러난 것이다. 화려한 백제 문화의 부활이었다.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번지던 한류 열풍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다. 우리의 의식 수준도 ‘우리 민족 제일주의’ ‘우리 문화 최고주의’라는 협소하고 배타적인 틀을 넘어 아시아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세계인을 지향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라는 단어도 이제 더는 낯설지 않다. 이 모든 흐름이 단군 이래 처음 겪는 일인 양 호들갑을 떨지만 실은 이미 1500년 전 백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3세기대부터 중국 왕조와 원거리 교섭을 추진한 백제인들은 풍납토성을 비롯한 많은 유적에 수백 점의 중국 물건을 남겼다. 중국 저장성의 월주요에서 구운 청자와 덕청요에서 구운 검은색 자기는 백제의 중앙은 물론이고 먼 지방의 수장묘에서도 발견된다. 4세기 이후 백제의 선진적인 문물은 이웃한 가야와 신라, 그리고 바다 건너 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중에는 백제의 원천 기술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고구려나 중국, 멀리 서역에 기원을 둔 것도 적지 않다. 외부의 선진 문화를 수용해 자기 것으로 만든 뒤, 주변에 일종의 보급판을 확산시키는 데 백제인들은 탁월했다.  백제 무령왕이 차고 매장되었던 환두대도 ‘다문화’, 단군 이래 최초라는 착각 이런 능력은 백제 문화의 개방성에서 기인했다. 중국 역사책을 보면 백제 땅에는 중국인, 가야인, 일본인이 섞여 거주한다고 했다. 4세기 전반 낙랑군과 대방군이 한반도에서 쫓겨나면서 발생한 난민 중 많은 수가 백제에 정착했다. 일본 쪽 역사책에 따르면 태어난 곳은 일본이지만 평생 백제를 위해 활동한 장군과 관료가 여럿 나온다. 이렇듯 다문화사회가 형성될 수 있던 배경에는 백제인의 열린 자세가 깔려 있었다. 비단 중국이나 일본 출신만이 아니었다. 4세기 침류왕 때 처음 불교를 전한 호승 마라난타는 그 이름을 볼 때 인도 출신임이 분명하다. 그는 서울 강남 어딘가에 세워진 사찰에 거주했는데, 이때 어떤 형태로든 인도 문화가 소개됐을 것이다. 6세기 전반 중국 양나라에 파견된 백제 사신은 양나라의 도성인 남경을 무대로 세계 각지에서 온 사신들과 조우했다. <양직공도>라는 그림에 표현된 12개국의 사신 중에는 백제와 왜 이외에도 실크로드 지역의 구자국(구차), 현재의 이란 땅에 해당하는 파사국(페르시아) 사신이 포함돼 있었다. 백제와 서역의 만남은 이미 이때 이곳에서 이뤄진 것이다. 사비기에는 동남아시아 민족과도 교섭이 이뤄졌다. 일본 쪽 사서에 따르면 성왕은 인도차이나반도에 거주하던 크메르족의 재물과 노예 2명을 긴메이 천황에게 선물로 주었으며, 의자왕대에는 무슨 일 때문인지 백제 사신이 동남아에서 온 사신을 물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다. 백제의 이런 원거리 교섭은 유적과 유물에 반영돼 있다. 무령왕릉의 구조는 직접적으로는 중국 남조의 벽돌 무덤을 모델로 삼았지만 아치형 구조물의 원류는 멀리 서쪽에 있다. 왕비의 금제 관식 무늬는 꽃병에서 곧게 뻗은 줄기에서 화사한 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인데 ‘삽화문’이라 불리는 이 무늬는 인도와 페르시아에 널리 퍼져 있으며, 중국을 거쳐 백제에 도달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고대국가 중 글로벌화에 가장 접근한 것은 백제라고 할 수 있다.  (위) 삽화문이 있는 무령왕비 관식. 권오영 한신대 교수 제공 (아래)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 양기석 충북대 교수 제공  (좌상) 중국 남조묘의 삽화문 / (좌중) 이란 저메모스크의 삽화문/ (좌하) 미륵사지석탑과 금제사리호 (우상)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 / (우하)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금제사리 봉안기 앞(위)과 뒤 고대의 한류 백제를 동아시아 문명 교류의 중심축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유는 선진 문물의 단순한 수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널리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바다 건너 일본 고대 문명 형성에는 백제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제도와 사상, 기술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달력, 음양오행, 풍수, 유학과 불교, 도교와 신선 사상, 의학, 약학, 문서 행정, 회화, 정원 조경술, 기와, 불상과 탑, 건물지로 구성된 사찰, 말의 사육, 유리와 금공제품 제작 기술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상과 기술이 일본에 전래됐다. 일본 고분 시대 물질문화의 변동,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의 번영은 백제를 빼고서는 이야기하기 힘들다. 백제가 일본에 끼친 영향은 여러 형태를 띠었다. 당대의 최고 지식인·학자·기술자가 정해진 기간에 일본에 파견돼 활동한 뒤 기한이 다하면 귀국하거나 그대로 정착하기도 했고, 때로는 수십∼수백의 무리가 일본열도 곳곳에 정착해 현지인들과 살아가기도 했다. 그 결과 일본열도 곳곳에서 백제식의 가옥과 토기가 많이 발견됐다. 특히 ‘부뚜막’이란 새로운 난방 및 조리 시설을 갖춘 가옥에서 시루를 이용해 곡물을 쪄먹는 풍습은 백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백제를 고향으로 두고 일본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죽어서도 고향식 무덤에 묻혔다. 금속제 장신구를 착용한 채 목관에 모셔진 주검을 굴식돌방무덤에 부부 단위로 나란히 안치하고 모형 부뚜막과 시루, 솥 등을 부장하는 풍습이 확인되면 일본인 연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도래인’, 즉 한반도계 이주민의 무덤이라고 인정한다. 이들의 고향이 한반도의 어디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은 백제 지역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오사카와 나라를 비롯한 긴키 지역에 이주 정착한 백제인 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발견되는 유적과 유물의 수를 감안할 때, 그들 스스로 지금 일본에 있는지 백제에 있는지 모를 때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일본 오사카 쓰루하시에는 한국인 거주지와 시장이 있고 전철만 타면 이곳저곳에서 한국어가 들리는데 고대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곳곳에 코리아타운이 서 있고 충청도·전라도 말이 불쑥불쑥 들리는 그런 정황이었음이 틀림없다. 백제계 이주민들은 점차 일본 사회에 동화해나갔지만 그들이 가져온 새로운 기술과 학문, 사상과 정보는 일본 사회를 크게 변모시켰다. 왕실과 귀족 사이에서도 백제식의 옷과 음식, 놀이, 장례 풍습이 유행해 가히 백제풍이 거세게 불었던 것이다. 문화강국, 지식대국 일본에서 백제풍이 거세게 분 이유는 백제 문화의 수준이 매우 세련되고 고급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추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4세기 중반 근초고왕대에 태자인 근구수를 도와 고구려와 전투를 치르던 막고해는 확전을 꾀하려는 태자를 말리면서 “도가의 말을 들어보니 족(足)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한다”라는 멋진 조언을 하고 있다. 일개 무장에 불과한 막고해가 이 정도라면 당시 지식인들의 학문적 수준은 얼마나 높았을까? 6세기 전반 중국 양나라에서는 ‘서성’ 왕희지의 글씨를 재현했다는 명필 소자운의 명성이 대단했다. 어느 날 소자운이 동양태수로 발령받아 임지로 떠나는데 백제 사신이 나타나 글을 얻기를 청했다. 소자운은 배를 멈추고 3일간 30장의 글자를 써주고 금화 수백만을 받았다고 한다. 명필의 글씨를 받기 위해 바다 건너 남경에 들어가서 부임지로 가는 그를 몸으로 막으면서 거리낌 없이 막대한 돈을 지출할 정도로 백제인들은 서예에 열심이었다. 이런 노력으로 부여에서 사택지적비가 나오고, 익산에서 유려한 글씨에 심오한 내용의 사리봉안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군사력은 고구려와 신라에 비해 열세였을지 몰라도 문화적인 능력과 지식의 축적 수준은 백제가 최고였다고 할 수 있다. 군사력이 최고의 가치였던 대살육의 시대에 백제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21세기에는 백제의 국가 전략을 새롭게 평가할 만하다. 중국의 다민족통일국가론과 동북공정, 일본의 구석기 날조 사건과 고대 한-일 관계사 왜곡, 북한의 단군릉 발견과 대동강문화론 등은 모두 배타적 국수주의의 산물이다. 인구나 군사력에서 중국과 일본에 뒤지는 대한민국이 이들과 끊임없이 군사적 갈등을 감수하며 경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현명한 대처일까? 역사분쟁이 역사전쟁으로, 역사전쟁이 영토분쟁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무책임하게 방조할 것인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제시됐던 동북아균형자론은 비록 냉엄한 현실 외교에서 실패했지만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민은 고대에도 지금도 엄존한다. 대한민국의 21세기 국가 전략을 ‘군사강국’ ‘영토대국’으로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강국’ ‘지식대국’으로 설정할 것인가? 비록 1400년 전 백제는 실패했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은 백제인의 전략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대백제’라는 용어는 이런 점에서 재음미돼야 할 것이다. 권오영 한신대 교수·국사학 |
<백제 무령왕릉의 유물> 왕의 유물 * 국보 154호 : 금제관식 * 국보 156호 : 금제심엽형이식(귀걸이) * 국보 159호 : 금제뒤꽂이 * 국보 165호 : 족좌(발받침) * 허리띠 * 신발 * 동제수저 왕비의 유물 * 국보 155호 : 금제관식 * 국보 158호 : 금제경식 * 국보 160호 : 은제팔찌 * 국보 157호 : 금제수식부이식(귀걸이) * 국보 164호 : 두침(베개) * 두침(베개), 족좌(발받침) * 다리미 * 신발 국보 제154호 무령왕 금제관식(武寧王 金製冠飾)   공주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백제 때 금으로 만든 왕관(王冠) 꾸미개(장식) 한쌍이다. 높이는 각각 30.7㎝, 29.2㎝이고, 너비는 각각 14㎝, 13.6㎝이다. 1971년 무령왕릉이 발견·조사되었을 때, 왕의 널(관) 안쪽 머리 부근에서 포개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금판을 뚫어서 덩굴 무늬를 장식했으며, 밑으로는 줄기가 있는데 아래위로 2, 3개의 작은 구멍이 있어 무엇인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좌우로 벌어진 줄기 중간에는 꽃 무늬를 배치하였으며, 줄기가 길게 연장되면서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준다. 두 가닥은 아래로 향하게 하여 변화를 주고있다. 앞면에는 전체에 걸쳐 구슬모양 꾸미개를 금실로 꼬아서 달았다. 국보 제155호 무령왕비 금제관식(武寧王妃 金製冠飾)   공주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백제 때 금으로 만든 관(冠) 장식으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으로 되어 있다. 높이 22.6㎝, 너비는 13.4㎝로 1971년 무령왕릉이 발견·조사되었을 때, 왕비의 널(관) 안쪽 머리 부근에서 포개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금판에 무늬를 뚫어서 장식하고 밑에 줄기를 달았다. 예리한 도구로 도려내어 무늬를 만들었는데 좌우대칭으로 정돈되어 매우 정연한 느낌을 준다. 중심부의 연꽃받침 위에 놓인 병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덩굴무늬가 있고 병 위에는 활짝 핀 꽃 한송이가 있다. 중간부터 위쪽의 가장자리에는 불꽃무늬가 표현되어 있다. 무령왕릉 안에서 같이 발견된 왕의 관(冠) 장식보다 규모가 조금 작고 구슬 등의 장식이 달려있지 않아 간결한 인상을 준다. 국보 제156호 무령왕 금귀걸이(武寧王 金製耳飾) 금제심엽형이식(귀걸이)  공주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백제시대의 금 귀고리 한 쌍으로 길이는 8.3㎝이다. 왕의 널(관)안 머리 부근에서 발견되었으며, 호화로운 장식이 달려있다. 굵은 고리를 중심으로 2가닥의 장식을 길게 늘어뜨렸다. 하나는 속이 빈 원통형의 중간 장식 끝에 금판으로 된 커다란 나뭇잎 모양의 장식을 달았다. 이 장식은 무늬가 없어 간소하지만 앞·뒷면에 타원형의 작은 잎을 하나씩 붙여 변화를 주었다. 옆으로 보면 안이 굽은 모습을 하고 있다. 원통형의 중간 장식에는 금선과 금구슬을 이용해 장식한 마개가 있고, 서로 마주보게 나뭇잎 모양의 장식을 둘렀다. 다른 한 가닥은 여러 개의 작은 고리로 이루어진 구슬 모양의 장식에 나뭇잎 모양의 장식을 연결하고, 끝에는 금모자를 씌운 푸른 곱은 옥을 매달아 금색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이런 2줄의 귀고리는 경주 금령총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다. 국보 제157호 무령왕비 금귀걸이(武寧王妃 金製耳飾)   공주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백제 때 귀고리 2쌍으로 길이는 11.8㎝, 8.8㎝이다. 왕비의 귀고리로, 굵은 고리를 중심으로 작은 장식들을 연결하여 만들었다. 한 쌍은 복잡한 형식으로 길고 짧은 2줄의 장식이 달려 있고, 다른 한 쌍은 1줄로만 되어있다. 앞의 귀고리 중 긴 가닥은 금 철사를 꼬아서 만든 사슬에 둥근 장식을 많이 연결하였으며, 맨 밑에는 작은 고리를 연결하여 8개의 둥근 장식을 달고 그 아래 탄환 모양의 장식을 달았다. 짧은 줄의 수식은 다른 한 쌍의 것과 거의 같은 수법이나 탄환 장식은 달지 않고, 잎사귀 모양의 장식과 담록색의 둥근 옥을 달았다. 국보 제158호 무령왕비 금목걸이(武寧王妃 金製頸飾)  공주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백제 무령왕비의 목걸이로, 길이는 각각 14㎝, 16㎝이다. 9마디로 된 것과 7마디로 된 것 2종류가 있는데, 발굴 당시 7마디 목걸이가 9마디 목걸이 밑에 겹쳐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활 모양으로 약간 휘어진 육각의 금막대를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하여 고리를 만들고 다른 것과 연결시켰다. 고리를 만들고 남은 부분을 짧은 목걸이의 경우 10∼11회, 긴 목걸이는 6∼8회 감아서 풀리지 않게 하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된 금막대마다 고리를 만들고 마무리를 한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2개의 목걸이 모두 한쪽 끝에 몸에 걸기 위한 작은 고리가 끼워져 있을 뿐 다른 장식은 하지 않은 간단한 구조를 하고 있다. 현대적 감각과 함께 매우 세련되어 보이는 작품이다. 국보 제159호 무령왕 금제 뒤꽂이(武寧王 金製釵)  공주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백제 때 금으로 만든 뒤꽂이 일종의 머리 장신구이다. 무령왕릉 나무널(목관) 안 왕의 머리에서 발견되었으며, 길이는 18.4㎝, 상단의 폭은 6.8㎝이다.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역삼각형 모양이며, 밑은 세가닥의 핀 모양을 이루고 있어 머리에 꽂았던 것으로 보인다. 역삼각형의 윗부분은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 3개의 꼬챙이쪽은 긴 꼬리처럼 되어 전체 모습이 날고 있는 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양 날개쪽 좌우에는 꽃무늬를 도드라지게 찍었고, 그 아래는 서로 대칭으로 덩굴무늬를 빈틈없이 메꿔 놓았다. 새의 머리와 날개 부분의 테두리는 끌 끝으로 찍은 작은 점들이 열지어 있다. 여기서 사용된 문양은 모두 뒤에서 두들겨 솟아 나오게 한 타출법(打出法)을 사용하였고 ,세부 표현에는 선으로 새기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왕의 머리부분에서 발견되었고, 끝이 3개로 갈라진 점으로 보아 의례 때 쓰인 머리 장식품으로 보인다. 국보 제160호 무령왕비 은팔찌(武寧王妃 銀製釧)  공주시 무령왕릉 왕비의 나무널(목관)내 왼쪽 팔 부근에서 발견된 한 쌍의 은제 팔찌로, 바깥지름 8㎝, 고리지름 1.1㎝이다. 팔목이 닿는 안쪽에는 톱니 모양을 촘촘히 새겼고, 둥근 바깥면에는 발이 셋 달린 2마리의 용을 새겼다. 용의 조각은 세밀하지는 않으나 힘이 있어, 묵직한 팔찌와 잘 어울리고 있다. 한 개의 팔찌 안쪽에 새긴 글로 보아 왕비가 죽기 6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만든 사람의 이름과 무게가 쓰여있다.  ▲ 왕비의 은제 팔찌 한 쌍에는 "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分二百州主耳"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 경자년은 왕비가 생존했던 520년으로 짐작되는데, 여기에 새겨진 장인 '多利'는 일본의 호류지(法隆寺) 삼존불의작가인 도리(止利)의 집안 선조였으리라 여겨지고 있다. 다리는 기록으로 나타난 우리 나라 최초의 공예가이다. ▲ 정재영(한국기술교육대 국어국문학)교수는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의 은팔찌(국보 160호)에서 서기 520년 백제시대에 쓰인 음각돼 있는 명문(銘文)인 이두문(吏讀文)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정교수는 한반도가 일본열도에 한자를 전파하는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것으로 해석했다. 2003.07.18 중앙일보 |
||
백제미에 보내는 무한한 경의 금동대향로·왕흥사 사리함·미륵사 서탑 사리호 등 아름다움의 구체화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 장엄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우리 문화에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백제의 아름다움에 아련한 향수 같은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딘가 품위 있고 우아하고 부드럽고 친숙한 느낌 같은 것이다. 그러나 막상 백제 미술을 상징하는 부여 정림사터 5층 석탑 앞에 서면 이 아름다운 건축물에 보내는 찬사보다 황량한 배경에 덩그러니 서 있는 쓸쓸함을 먼저 말하며, 백제 성왕·위덕왕·무왕 시절의 찬란한 전성기 문화보다 의자왕 시절 패망에 이르는 아픈 기억을 먼저 새기곤 한다. 그동안 백제 유물 중에는 웅혼한 기상이 깃든 고구려의 고분벽화, 화려한 금관이 있는 ‘눈부신 금과 은의 나라’ 신라에 걸맞은 구체적 이미지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발굴된 아름다운 향로와 사리함이라는 금속공예품들로 우리는 이제 ‘백제미’에 대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베일 헤치며 나타난 무령왕릉 베일 속에 가려진 백제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릉이었다. 이는 해방 뒤 우리나라 고고학과 미술사의 최대 성과로, 여기서는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라는 기록(매지권)과 함께 금관을 비롯해 총 108종 2906점의 유물이 수습됐다. 일제시대 도굴로 실체를 잃었던 백제 고분미술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쾌거였다. 그러나 무령왕릉의 유물들은 백제 아름다움의 보편적 이미지만 전해주었지 딱히 한 점으로 백제를 대변할 유물은 없었다. 그러다 1993년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바로 곁에 있는 능사(陵寺)에서 발견된 백제금동대향로는 이런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6세기 후반 위덕왕 때의 유물로 추정되는 이 백제금동대향로는 규모가 크고 기법이 완벽한데다, 대상의 묘사가 정확하며, 상징적 내용이 풍부한 백제미의 진수로 동시대 중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향로는 높이 64cm, 무게 11.8kg으로 다른 향로보다 두 배 크기이며, 봉황이 올라앉아 있는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용이 입에 물어 올리는 모습이다. 용은 힘껏 용트림을 하고 있고, 봉황은 한껏 날갯짓을 하려는 순간을 포착했다. 대단한 동감이 일어난다. 이에 반해 몸체와 뚜껑으로 이뤄진 꽃봉오리는 풍만하면서도 팽팽한 볼륨감이 넘친다. 정(靜)과 동(動)의 절묘한 조화다. 뚜껑에는 무수한 그림이 새겨져 있다. 불사조·물고기·사슴·학 등 동물이 26마리, 네댓 겹으로 첩첩산중을 이루는 25개 산봉우리. 거기에는 산길, 계곡, 폭포, 호수가 있다. 솔숲이 6곳, 바위가 12곳이다. 산봉우리에는 피리·비파·거문고·북 등을 연주하는 5인의 악사와 각종 무인상, 기마수렵상 등 16인의 인물상이 있고, 또 봉황·용·호랑이·사슴 등 상상과 현실 세계 동물 39마리가 들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약 100가지 도상은 백제인의 관념 속에 들어 있던 신선 세계의 모습이다.  백제금동대향로. 금동대향로의 충격과 감동 이 향로는 기본적으로 한나라 때부터 유행한 박산향로(博山香爐)의 형식을 따른 것이다. 박산이란 동쪽 바다 한가운데 불로장생의 신선이 살았다는 삼신산, 즉 봉래산·영주산·방장산을 말한다. 백제금동대향로는 이런 도교적인 상징성의 박산향로를 불교적 이미지인 연꽃과 결합시키면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공예는 ‘용’(用)과 ‘미’(美)로 이뤄진다. 백제금동대향로는 쓰임새에서도 아주 뛰어나다. 향로 뚜껑의 산봉우리 뒤에는 10개의 구멍이 있어 향을 피우고 뚜껑을 닫으면 향 줄기가 구멍을 통해 피어오르게 돼 있다. 백제금동대향로가 발견됐을 때 일부에서는 이 유물이 과연 백제에서 제작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에 걸맞은 백제의 다른 유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부여 왕흥사터에서 금·은·동 한 세트의 아름다운 사리함이 명문과 함께 발견되고, 2009년에는 익산 미륵사 서탑을 해체 보수하던 중 더없이 화려한 금사리호가 출토되면서 그런 의심은 일거에 가시게 되었다. 백마강 구드레 나루터 건너편에 있는 왕흥사터에서 발견된 금·은·동 사리함에는 577년 백제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사찰을 세우고 사리를 모셨다는 글씨가 새겨 있어 누구도 백제의 유물임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미륵사 서탑 사리호에서는 총 194자가 새겨진 금제사리봉영기도 함께 출토됐는데, 내용은 무왕 40년(639)에 왕후인 사택적덕의 따님이 봉안했다는 것이다. 왕흥사 사리함은 아주 단아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동사리함은 소박하고, 은사리함은 듬직하며, 금사리함은 고귀한 자태를 자랑한다. 단순한 디자인 같지만 그 심플한 멋에서 다가오는 우아함과 품위에는 현대 금속공예도 따를 수 없는 세련미가 있다. 화려하면서 사치스럽지 않은 이에 비해 익산 미륵사 서탑의 사리호는 말할 수 없이 화려하다. 몸체에는 환상적인 인동초와 넝쿨무늬를 배열하면서 여백에는 어자무늬(魚子紋)라는 물고기 알 모양의 작은 동그라미를 촘촘히 넣었다. 무늬의 구성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새김 기법도 점·선·면의 처리를 능숙하게 구사해 더없이 세밀하고 화려하다. 왕흥사터 사리함에 고전적인 기품이 있었다면 이 미륵사지 서탑 사리호에는 바로크적인 과장과 화려함이 넘쳐난다. 이제 어느 누구도 백제의 뛰어난 금속공예술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제의 아름다움에 대한 재인식까지 생겼다. 1965년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에서 출토된 금사리함과 유리 사리병은 아름다운 형태미와 섬세하고 화려한 무늬새김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사리함으로 손꼽히며 대개 통일신라의 유물로 추정해왔다. 그러나 사리함 몸체에 연꽃과 넝쿨무늬를 면새김으로 처리한 것과 바탕무늬로 동그라미를 장식한 것, 그리고 이파리 3개가 난 연꽃잎과 어자무늬는 미륵사 서탑 사리호와 거의 한 솜씨로 보일 정도다. 이제 미술사가들은 백제의 유물로 고쳐 생각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백제금동대향로, 왕흥사 사리함, 미륵사 서탑 사리호, 왕궁리 석탑 사리함과 사리병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백제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가지며 이에 대해 무한한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찾아낸 백제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미학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온조왕 15년(기원전 4)에 위례성에 새로 궁궐을 지었다면서 표현한 다음과 같은 여덟 글자 속에 들어 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유홍준 명지대 교수·미술사 |
국보 제161호 무령왕릉 청동거울 일괄(武寧王陵 銅鏡一括) 공주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청동거울로 청동신수경, 의자손수대경, 수대경 3점이다. 청동신수경은 ‘방격규구문경’이라는 중국 후한의 거울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거울 내부에는 반나체 인물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한나라의 거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의 자손수대경은 중국 한대의 수대경을 본떠 만든 복제품이다. 거울 중앙의 꼭지를 중심으로 9개의 돌기가 있고, 안에는 크고 작은 원과 7개의 돌기가 솟아있다. 내부 주위의 테두리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나 선명하지 못하여 알아볼 수 없다. 수대경 역시 한나라 때 동물 문양을 새겨 넣은 수대경을 본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 거울에 비해 선이 굵고 무늬가 정교하지 못하다. 국보 제161-1호 청동신수경(淸銅神獸鏡)  공주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청동으로 만든 거울로 지름 17.8㎝이며, ‘방격규구문경’이라는 중국 후한의 거울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거울 중앙의 꼭지를 중심으로 12개의 작은 돌기가 솟아있으며, 돌기 사이사이에 십이지(十二支)의 문자를 하나씩 새겼다. 안쪽의 원둘레에는 아랫도리만 입고 창을 들고있는 인물상과, 달리고 있는 4마리의 동물상이 반입체적으로 새겨져 있으며, 안쪽의 원 둘레에는 글이 새겨있다. 국보 제161-2호 의자손수대경(宜子孫獸帶鏡)  공주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중국 한나라 수대경을 본떠 만든 지름 23.2㎝의 거울이다. 거울 중앙의 손잡이 역할을 하는 꼭지를 중심으로 9개의 돌기가 있다. 그 위 안쪽으로 있는 크고 작은 원에는 7개의 돌기가 있으며, 사이에는 천지사방을 맡아 다스린다는 사신과 상서로운 동물들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안쪽 원들 주위 테두리에는 명문이 있으나, 선명하지 못하여 판독이 불가능하다.  국보 제161-3호 수대경(獸帶鏡)  공주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중국 한나라 때 동물들을 문양으로 새겨 넣은 거울인 수대경을 본받아 만든 지름 18.1㎝의 거울이다. 거울 중앙의 꼭지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돌기가 있다. 안쪽에는 크고 작은 원이 있고 그 사이에 7개의 둥근 돌기와 사신(四神), 세 마리의 상서로운 동물무늬가 가는선으로 새겨져있다. 바깥쪽의 원둘레에는 덩굴무늬를 새겼다. |
||
백제로 들어와 동아시아가 최고가 되다 다문화성에서 꽃핀 고대 문화·예술의 극치… 한국 문화사의 금자탑  국보83호 반가사유상 (왼쪽)과 고류지 목조 미륵반가사유상. 권오영 한신대 교수 제공 백제의 문화유산은 멸망할 때 철저히 파괴됐다. 그리고 이후 승리자인 신라의 입장에서 백제의 역사는 왜곡·축소됐다. 흔적이 사라진 백제 문화의 성취는 오히려 일본에 많이 남아 있다.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고류지(廣隆寺) 미륵반가사유상과 호류지(法隆寺) 백제관음이 백제의 작품이거나 백제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두 불상은 일본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대표적인 명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세계인의 예술적 감수성에 심금을 울리는 걸작이다. 이와 함께 쇼소인(正倉院)에 보관된 의자왕의 바둑판과 바둑알은 인간이 다다른 공예미술의 극치를 보는 느낌을 준다. 일본 최고 걸작은 백제 미술품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때, 5천 년 역사를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의 명품 10선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유물 가운데 놀랍게도 백제 유물이 세 점이나 차지하고 있었다.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1위), 백제금동대향로(3위), 백제산경문전(9위) 등이다. 고대 삼국의 하나에 불과했던 백제가 이처럼 뛰어난 세계적 문화유산을 생산해 한국 미술사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었던 문화적 역량과 배경은 무엇일까.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무기가 많다. 하지만 백제 칠지도(七支刀)만큼 독특한 무기도 드물다. 칼의 좌우로 3개씩 가지가 뻗어 있고, 몸체에는 글자를 금상감 기법으로 음각했다. 글자체로 미뤄 제작 연대가 백제 한성기로 추정되는데, 당시에 이런 형태의 칼을 고안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파격적이고 독창적이다. 그렇게 만든 백제인은 거기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칼의 명문에 “선세 이래 이러한 무기가 없었다”라고 하였듯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런 형태의 무기는 전무후무하다. 그리고 “후세에 전하여 보여라”라고 한 데에서, 당시 백제국의 문화적 역량을 영원히 과시하려는 강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칠지도 명문에 보이는 ‘성음’(聖音)은 칠지도를 창조한 백제국의 자랑스러운 당대가 성음의 시대였다는 것을 표현한다 선덕여왕이 초치한 백제의 장인들 백제의 문화적 수준은 우선 미륵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미륵사에는 석탑 2기와 중앙에 더 규모가 큰 목탑이 배치됐는데, 이 탑은 기존 목탑에서 석탑으로 발전해간 시원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신라가 삼국통일을 위해 국가 제일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던 황룡사 9층탑 건립도 백제의 건축기술을 빌려야 했다. 선덕왕이 황룡사 탑을 세우려 했을 때, 여러 신하들이 “공장(工匠)을 백제에 청한 후에야 바야흐로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신라는 삼국통일의 상징 탑을 건립하면서 국가적 자존심을 접고 적국인 백제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지 않을 수 없었다. 백제는 이미 아날로그 목탑의 시대가 가고 디지털 석탑의 시대였다. 그래서 30여m에 이르는 거대한 미륵사 석탑을 2기나 세운 것이다. 그런데 당시 신라에서는 목탑을 세울 기술도 없어서 황룡사 9층탑을 세우는 데 백제의 공장을 초치한 것이며, 이는 양국 간의 어쩔 수 없는 문화적 수준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백제 불교미술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은 단연 백제금동대향로다. 당시 동아시아 어느 국가에서도 백제금동대향로 같은 디자인과 표현력을 갖춘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백제금동대향로는 중국 박산향로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 5악사를 향로 가장 중요한 곳에 배치해 향로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고대국가 통치에서 중요시한 음악을 강조해 당시 백제국의 문화적 수준을 엿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일본군마현에서 발굴된 찻잔, 무령왕릉 찻잔, 중국 남조의 찻잔(왼쪽부터). 권오영 한신대 교수 제공 한국 도예와 산수화의 뿌리 도자기 분야도 백제가 삼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여준다. 무령왕릉에서 나온 백자잔 같은 유물은 중국 최초의 백자잔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6세기 말과 7세기 전반에 걸쳐 편년되는 녹유(綠釉) 유물들은 한반도의 토기문화가 도기문화로 발전해간 증거다. 한반도에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된 토기문화에서 유약을 발라 만든 도기가 출현한 것은 엄청난 기술혁신이었다. ‘토기→도기→자기’로 발전해가는 도자문화 가운데 토기에서 도기로의 대전환이 백제 시대에 일어난 것이다. 백제 미술 전형의 장르로서 와전을 빼놓을 수 없다. 백제 와전의 특징은 온화하면서도 도탑고 부드러우면서 우아하다. 특히 부여 외리의 절터에서 발견된 전돌은 황금시대 통일신라의 미술을 알리는 전주곡의 성격을 띠면서 백제의 조형 역량을 과시한 아름다운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제문양전 가운데 산수문전은 후대 산수화가 갖추어야 할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한국 회화사에서 본격적인 산수화의 탄생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백제 불상들은 인간적이고 친근하다. 특히 7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신체의 풍만함이 강조되고 얼굴은 더욱 인간적인 형상이 되면서, 서산마애삼존불에서 보듯이 이른바 ‘백제의 미소’라고 할 수 있는 밝고 명랑하며 평화로운 미소가 두드러진다.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은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미술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는다. 제작국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자가 이견을 보이지만, 반가사유상에 표현된 전체적 조형성이나 얼굴 표정, 입가의 미소, 선의 흐름 등을 볼 때 백제의 흔적과 체취가 완연하다. 위진남북조의 예술, 백제에서 결실 위진남북조시대는 중국 예술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기였다. 기술의 시대에서 예술의 시대로 나아간 것이다. 인간 의식의 거대한 흐름이 위진남북조시대로 수렴됐다가 이후 확산돼, 중국 예술사의 분수령을 이루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자, 예술을 위한 예술의 탄생이었다. 그런데 수(隋)가 남북조를 통일했으나 자기의 독창적인 문화예술을 성립시키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 존속했고, 당(唐) 또한 자기 문화를 이룩하기에는 극히 초반이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백제는 동아시아에서 위진남북조가 이룩한 문화예술의 성격을 그 극점까지 확장해 나아간 것이다. 중국·한국·일본을 아우르는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필 때,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문화의 찬란한 결실이 백제에 와서 맺은 것을 알 수 있다. 웅진 시대 백제 문화는 중국 남조 문화를 완벽하게 수용했으되 그 수준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그러나 부여로 도읍을 옮기고 남북조의 문물을 끊임없이 수혈하는 과정에서 강하고 독자적인 문화적 전통을 형성해나갔다. 그 결과 그동안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한꺼번에 분출돼, 7세기 초반에 백제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이자 한국 문화사에서 찬란한 금자탑을 이루게 된 것이다. 백제금동대향로와 금동반가사유상, 백제산경문전, 고류지 미륵반가사유상, 호류지 백제관음이 또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내옥 국립대구박물관장 |
국보 제162호 석수(石獸)  널길의 입구 중앙에 밖을 향하여 놓여 있었으며 재료는 응회암제 이다. 뭉뚝한 입을 벌렸고 코는 크나 콧구멍은 없고 높은 콧등날이 등뒤까지 계속되었고 그 좌우에 눈과 귀가 있다. 등에는 불룩 튀어나온 긴 무늬가 네 곳에 있고 머리 위 융기 위에는 철제의 나뭇가지모양의 뿔이 패어진 홈에 꽂혀 있다. 몸통 좌우에는 앞뒤에 날개모양 갈기가 새겨져 있다. 출토 당시부터 오른쪽 뒷다리는 파손되어 있었다. 이 석수는 중국 한 대(漢代)이래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뜻으로 무덤내부 앞에 세우는 진묘수(鎭墓獸)의 일종이다. (위키백과)     무령왕릉 석수는 높이 30.8㎝, 길이 49㎝, 너비 22㎝로 통로 중앙에서 밖을 향하여 놓여 있었다. 입은 뭉뚝하며 입술에 붉게 칠한 흔적이 있고, 콧구멍 없는 큰 코에 눈과 귀가 있다. 머리 위에는 나뭇가지 형태의 철제 뿔이 붙어있다. 몸통 좌우, 앞·뒤 다리에는 불꽃무늬가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날개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꼬리가 조각되어 있으며 배설 구멍이 달려 있을 정도로 사실적이다. 무덤 수호의 관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이다.   |
||
중생의 얼굴을 한 백제의 미소 신라의 귀족적 불상과 울림이 달라...토착신앙 강한 일본도 감화  서산 마애삼존불상 12년 전, ‘백제 불교’의 현장을 처음 발로 찾아간 날을 지금도 기억한다. 충남 지역의 고대·중세 유적을 탐방하다가 결국 서산 근처 마애삼존불을 보러 간 것이다. 주차장에서 꽤나 걸어가고, 개울을 다리로 건너 계단으로 오르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가슴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익히 들었던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84호)의 유명한 ‘백제의 미소’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궁금했다. 사진으로는 옛날부터 많이 봐온 불상인데도, 직접 그 모습을 보니 감회는 유달랐다. 중앙에 서 있는 여래불의 살찐 듯하고 포근한 듯한 얼굴, 반원형의 매력적 눈썹, 넓은 코, 튀어나온 듯한 볼…. 열반에 든 초월적·탈속적 ‘부처’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저잣거리의, 옆집의 마음씨 좋고 인연들을 잘 챙겨주는 아저씨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후덕하고 풍만한 얼굴의 따뜻한 미소…. 최고의 진리를 터득한 ‘초인’으로서의 부처가 아니고 늘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자비행을 하면서 세상에 따뜻한 빛을 발산하는, 화광동진(和光同塵)하면서 묵묵히 선행을 행하는 유마(維摩) 거사와 같은 모습이었다. 여래불 오른쪽에 서 있는 과거의 부처인 제화갈라보살(提和竭羅菩薩)과 왼쪽의 미래불인 미륵불도 하나같았다. 그때까지 많은 부처들을 봤지만, 이만큼 친근한 부처는 처음 본 것인지라 감동은 참으로 깊었다. 처음 본 친근한 부처의 감동 같은 부처라 해도 만드는 사람과 주문한 사람, 예불하려는 신자들의 의도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6세기쯤으로 추정되는 서산마애삼존불상보다 약 한 세기 늦은 7세기 중반으로 보이는 신라의 금동보살입상(국보 184호) 같으면 역시 둥근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지만, ‘포근한’ 미소라기보다는 우아하고 탈속(脫俗)적인 듯한 귀족적인 미소다. 세인들과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신라 불상의 날씬한 육체도 상당한 ‘귀족성’을 내비치는데, 이는 그 시대 신라 불상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백제 불상들은 가시적으로 다르다. 예컨대 일제 말기에 출토돼 백제의 ‘대표적 불상’으로 알려진 군수리 절터의 석조여래좌상(보물 329호)과 같은 곳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입상(보물 제330호)을 봐도 ‘귀족티’가 전혀 나지 않고 풍만하고 포근하고 친근할 뿐이다. 백제 불상들은 왜 하필 이처럼 범용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의 부처를 중생들에게 보이는가? 이는 백제 불교의 특성으로서 ‘완숙함’과 놀라운 ‘풍토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신라보다 한 세기 반 일찍이, 즉 384년에 불교를 유서 깊은 중국 남부 지방으로부터 받아들인 백제에서는, 불상이 많이 제작되기 시작한 6세기 중반에 이르러 불교가 이미 현지인의 토착성이 강한, 완전히 ‘백제화’된 신앙으로 정착·발전한 것이다. 소박하게 ‘평안’ ‘다산’ ‘공동체의 화목’을 다 함께 기원했던 현지인의 토착화된 신앙이다 보니 부처도 너나 나나 다 될 수 있는 ‘착한 아저씨’로 변하고 말았다. 그만큼 방방곡곡 선남선녀들의 가슴 깊이 부처의 자비의 이상이 새겨졌던 것이다.  국보 330호 금동보살입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구려보다 더 빨랐던 천태교학 그렇다고 백제 불교가 세계와의 소통을 피한 것도 아니다. 고대 동북아의 국제 허브인 백제의 불교인 만큼 ‘국제성’도 남달랐다. 경쟁국인 신라와 고구려의 불교보다 백제 불교는 중국 불교의 최신 동향을 읽는 데 자주 선수를 치곤 했다. 예를 들어 고려 말까지 한반도 불교의 주류 경향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잡은 천태(天台) 교학이었지만, 그 수입에서 누구보다 백제가 빨랐다. <송고승전>이라는 중국 송대의 자료에 따르면, 백제의 승려 현광(玄光)은 일찍이 중국 천태종의 제3조인 혜사(慧思·515~577) 스님이 남악산에서 주석했던 567~577년쯤 그 밑에 들어가서 <법화경>의 오묘한 의미와 법화삼매, 즉 <법화경> 봉독을 수반한 참선의 비법을 익혔다고 한다. 현광의 경전 이해 수준과 참선 능력이 꽤나 좋았던 모양으로, 그 영정이 중국 천태종의 중심 사찰인 국청사(國淸寺)의 조당(祖堂)에 모셔질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나중에 고구려의 파약(波若) 스님 등 고구려·신라 출신들도 천태학에 천착해 중원에서 명성을 얻은 일은 있었지만 이는 이미 혜사의 제자인 지의(智?·538~597)가 황실의 외호를 받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수나라 시절(581~618)이었으며, 그보다는 현광이 빨랐다. 고구려·신라보다 중국과 어쩌면 더 적극적인 불교 교류를 해온 백제는, 이와 함께 익히고 토착화한 불교를 일본열도에 전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552년 신라·고구려와 싸우면서 야마토(大和) 정권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백제 성왕(재위 523~554)의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이뤄진 불교 전래였다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다른 자료에 나오는 538년이라는 더 이른 연대를 백제가 일본열도에 불교를 전한 시점으로 본다. 쇼토쿠 태자, 극진한 예 표시 고대 한반도 국가들과 달리 야마토에서는 귀족 가문들과 긴밀히 연결된 토착신앙이 상당한 정치적 기반을 다져 불교 국교화에 가열찬 저항을 펼쳤는데, 이 저항을 눌러야 했던 봉불파(奉佛派)들은 일본열도 주민에게 백제의 높은 문화적 권위를 부단히 이용해야 했다. 그래서 대표적 봉불파인 쇼토쿠(聖德) 태자(574~622)는 583년 백제 사신으로 도일한 사문 일라(日羅)를 보고 ‘구세(救世)관세음’ ‘신인’(神人)이라고 하여 무릎을 꿇고 예를 다할 정도로 극도의 존경을 표했다. 결국 백제의 완숙한 관세음 신앙의 권위를 빌려 일본열도에서 이와 유사한 신앙의 씨를 뿌리면서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공고화하려 했던 것은 쇼토쿠의 계산이었을 터인데, 여기서 백제가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이다. 백제 승려의 권위는 왜 일본열도에서 그토록 높았을까? 단순한 설법이나 교의 전수에 그치지 않고 사회 발전에 필요한 수많은 지식과 솜씨들을 전해줌으로써 ‘요익중생’(要益衆生)이라는 사문의 의무를 제대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쇼토쿠의 스승 중 한 명인 백제 승려 관륵(觀勒)은 602년 일본열도에 도착했을 때 불경뿐 아니라 지리·천문·책력 관련 서적까지 다 가져왔다. 백제는 6세기 후반 초기 일본 승려들이 불교와 제반 선진 문화를 배우기 위해 유학 가기 시작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했다. 신라와 당나라의 협공에 백제는 무너졌지만, 백제 불교의 전통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백제 승려들에 대한 기억은 일본에서 계속 간직됐으며, 통일신라 시기에도 백제 유민들 사이에서 그 지역 출신의 진표 율사(8세기)의 점찰(占察·점치고 숙생의 죄업을 참회함) 운동이 인기를 끄는 등 종교적 결속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따뜻한 미소를 짓는 백제인의 모습을 띤 부처는, 이미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에 각인돼 있었으며, 일본 등 다른 지역들의 중생까지도 크게 감화시켰기에 나라는 망해도 그 불교는 여전히 힘을 발휘했다. 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 |
국보 제163호 무령왕릉 지석(誌石) 이 지석은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과 왕비의 지석으로 2매이다. 이 2매의 지석은 왕과 왕비의 장례를 지낼 때 땅의 신에게 묘소로 쓸 땅을 사들인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돌에 새겨넣은 매지권으로, 1971년 무령왕릉이 발견될 때 함께 출토되었다.  왕의 지석은 가로 41.5㎝, 세로 35㎝이며, 표면에 5∼6㎝의 선을 만들고 그 안에 6행에 걸쳐 새겼다. 왕의 기록은『삼국사기』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뒷면에는 주위에 네모나게 구획선을 긋고 그 선을 따라 12방위를 표시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쪽 부분은 표시하지 않았다. <표면(表面)> 寧東大將軍百濟斯」 麻王 年六十二歲 癸」 卯年五月丙戌朔七」 日壬辰崩 到乙巳年八月」 癸酉朔十二日甲申 安厝」 登冠大墓 立志如左」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는 계묘년 5월 7일 임진날에 돌아가셔서, 을사년 8월 12일 갑신날에 이르러 대묘에 예를 갖추어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왕의 지석 이면(裏面)과 십이간지도 未------------------------------亥 丁------------------------------壬 午------------------------------子 丙------------------------------癸 巳------------------------------丑 --戌--------------------------己-- ----辰---乙---卯---甲---寅----- 1971년 무령왕릉 출토 무령왕 지석(묘지) 뒷면(가로 41.5, 세로 35㎝) 십이간지 방위표 탁본(왼쪽)과 그 복원도(오른쪽). 서쪽에 해당하는 방위명들인 申ㆍ庚ㆍ酉ㆍ辛ㆍ戌가 없는 까닭은 무령왕이 지신에게서 산 무덤 부지가 바로 '서쪽 땅'이라는 주장이 일본 히로시마대학 시라스 죠신(白須淨眞)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가운데 구멍은 오수전이란 동전 꾸러미를 꿴 끈을 묶은 공간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2007-09-06 다른 하나는 왕비의 지석인데 가로 41.5㎝, 세로 35㎝이며, 2.5∼2.8㎝ 폭으로 선을 긋고 4행에 걸쳐 새겼다. 선을 그은 부분은 13행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공백으로 그대로 남겨 두었다. 이 왕비의 지석 뒷면에는 매지문(買地文:땅을 샀다는 문서)을 새겼다. 원래 매지권은 무령왕을 장사지낼 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 후 왕비를 합장하였을 때 이 매지권의 뒷면을 이용하여 왕비에 관한 묘지문을 새겼던 것이다. * 무령왕이 523년에 죽고 3년상을 치르기 위하여 2년 3개월간 가매장하였다가 왕릉에 안치할 때 왕의 묘지와 간지도, 매지권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후 526년에 왕비가 죽자 3년상을 치른 후 529년에 안치할 때 매지권을 상하로 뒤집어 뒤편에 왕비의 묘지를 새겼다. 이 지석은 한국 지석 중 가장 오래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지석이 출토됨으로써 무령왕릉은 삼국시대의 왕릉 중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 되었다.  왕비 지석의 앞면  왕비의 지석 뒷면과 이곳에 적힌 매지권 (글이 뒤집어져 있다) * 매지권 : 무령왕릉 지석 뒷면에는 무령왕이 토지신에게 돈 1만닙를 주고 능을 만들 땅을 사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토지매매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중국 돈인 오수전을 그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아 오늘날과 유사한 화폐거래를 통한 토지 매매를 유추할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돈 1만닙, 다음의 건. 을사년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앞에 든 돈으로 토지신 토왕, 토백, 토부모, 연봉 2000석 이상의 여러 관료에게 나아가서 서쪽 땅을 사들여 묘을 만들었으니 문서를 만들어 남긴다. 현 율령에 따르지 않는다. * 지석의 내용은 짧지만 《삼국사기》 에 누락된 사실을 보충할 수 있었고 매지권에서 알 수 있듯이 백제인들의 사상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이 지석 2장이 고분 축조연대를 분명히 제시해주었기 때문에, 무령왕릉의 출토 유물은 삼국시대 고고학 편년연구에 기준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다른 유물들과 함께 6세기 초 백제와 중국 남조와의 문화적 교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영동대장군이란 무령왕이 중국 양나라 고조에게서 받은 작호이며, 사마왕은 무령왕의 이름인데 《삼국사기》에는 "斯摩"로, 《일본서기》에는 "斯麻"로 기록되어 있다. 왕의 죽음을 붕(崩), 무덤을 대묘(大墓)로 표현하고 있다. 지석에 새겨진 무령왕릉의 사망년월은 《삼국사기》기록과 동일하다.  무령왕 墓誌 구멍의 비밀 마침내 풀렸다 日학자 "墓地구입 돈꾸러미 끼운 곳" |
||
‘글로벌 백제’의 신도시, 사비 프라하·페트라 못지않은 역사도시 복원에 대한 설렘  사비 나성 상상도 금동대향로 이후 다시 잊혀진 백제 2009년 3월, 요르단 페트라.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서 해리슨 포드가 성배를 찾으러 가던 길. 페트라는 기원전 유목민들이 만든 거대한 산악도시다. 이곳 사람들 풍경도 프라하와 다르지 않았다. 하루 종일 발바닥이 붓도록 걸었다. 2천 년 전 고대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기이한 매력이었고, 걷는 동안만큼은 피로한 것도 몰랐다. 페트라가 요르단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라고 한다. 과연 요르단이 ‘중동의 석유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다’고 자랑하는 국보답다. 2009년 6월 페트라의 감동이 채 잊혀지기 전, 어느덧 기획안 공모의 시즌이 왔고, 난 늘 그랬듯 두서없이 웹서핑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세계대백제전 준비에 대한 단신이었다. ‘세계’라는 말이 다소 엉뚱하게 들려서 좀더 들여다보니 준비 기간 10년 이상에 투입된 예산 역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대체 뭔 일인가?” 나 역시 처음엔 나를 보는 주변인들의 생뚱맞은 반응과 다를 바 없었다. ‘무얼 위해 그 많은 예산을 쏟아부을까?’ 답은 어렵지 않게 나왔다. 먹고살기 위해. 역사는 교육이자 산업이다. 세계는 지금 사라진 도시들을 복원하고 있다. 로마, 앙코르와트, 교토…. 과거와 더 가깝게 복원하고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어찌 외국의 역사도시에서 감흥을 얻은 사람이 나뿐이랴. 문제는 과연 백제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1993년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백제 금동대향로의 발굴 이후, 세상은 또 백제를 잊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향토 연구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비성 건축 재현. 컴퓨터 그래픽 습지대에서 계획신도시로 왕궁터 추정지, 격자형 도로 유적 발굴, 남북 대로 정북방향 확인, 6.3km에 이르는 나성, 목곽 수조와 배수로를 갖춘 물 관리 시스템. 모두 계획신도시의 흔적들이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백제 시대 이전의 부여 땅이 사람이 살지 않던 습지대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1400년 전의 분당, 일산이 따로 없다. 애초부터 존재했고 발전시켜온 신라의 서라벌과는 아예 콘셉트 자체가 다르다. 한반도 최초의 계획신도시 사비성은 점점 프라하나 페트라와 오버랩됐다. 세계적 문화유산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도시. 기획 단계 초기의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자료 조사는 피로감을 잊은 채 진행됐고, 사비성 복원 작업은 그 첫발을 내디뎠다. “성왕 16년 봄, 백제는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하였다.” <삼국사기> 이것이 사비성 건설 혹은 사비 천도에 대한 유일한 역사 기록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없는 자료를 찾아 헤매고 엮는 것이었다. 백제는 저항하다 패망한 국가였던 만큼 남은 유물이 적고, 게다가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의 의도적인 왜곡도 만만치 않다. 역사의 빈틈을 메우는 건 상상력이었다. 제작진과 자문진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이기도 하다. 사비성 복원은 2000년대 들어 발굴된 유물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필자는 내심 ‘삼천궁녀’와 ‘의자왕’으로 기억되는 백제의 오랜 편견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려 했다. 그것은 백제에 대한 단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즉 백제가 글로벌 국가였다는 사실을 시청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제작진에게 성왕의 사비성 건설만큼이나 어려운 도전이었다.  교육방송 <사비성, 사라진 미래의 도시> 팀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계획도시 사비성의 모습. 스토리가 살아 숨쉬는 다큐 그 첫 번째 목표가 ‘비주얼 쾌감’이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는다. 그동안 백제의 역사가 소홀히 취급된 것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한 탓이다. 다큐멘터리는 1400년 전 사비성 전체를 그래픽으로 복원해냈다. 사비왕궁, 바둑판식 시가지, 민가와 귀족 사택 그리고 사비 백제를 대표하는 구드래 국제항까지. 이를 위해 제작 전 단계에서 6개월간 전문가 13명(고고학, 역사학, 건축학, 천문학)의 고증을 거쳤다. 또한 합성 편집 방식을 전격적으로 도입해,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왕궁 건설 장면을 현실에 가깝게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 사상 최초로 레드원 카메라를 도입해 보는 즐거움을 배가하려 했다. 두 번째는 스토리가 숨쉬는 다큐멘터리를 지향했다. 역사의 빈자리를 메워줄 이야기,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고증에만 매달리지 않고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려 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컴퓨터 그래픽이 일궈낸 비주얼의 개가가 아니다. 그 도시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음으로써 역사 혹은 과학, 고고학적 유물로만 존재하는 과거를 영원히 구전될 이야기로 남겨놓으려 했다. 10년 뒤 과연 이 땅의 초등학생들은 백제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간직할까. 또 어떤 것이 학계를 놀라게 할까. 우리 또한 프라하나 페트라 못지않은 역사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백제의 역사가 1400년이나 땅속에 묻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보다 훨씬 흥미진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민태 교육방송 기획다큐부 PD |
|||
한류의 원조, ‘백제류’ 중국 왕조엔 정치적 역할 수행… 일본인에겐 사상과 종교, 예술의 스승  백제 기술로 만든 아스카지, 아스카지 불상. 사진 권오영 한신대 교수 제공 ‘구다라나이’ (百濟無い). 무슨 말인가? ‘하찮다’ ‘별것 아니다’란 뜻의 일본어다. 그런데 그 어원은 구다라(백제), 나이(아니다), 곧 ‘백제가 아니다’이다. 백제 문화가 왕성하게 수입되던 고대 일본에서 백제 것이 아니면 시시하다는 인식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1960∼70년대 미국과 일본 물건을 제일로 쳤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백제는 일본의 고대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일본 문화를 이루는 원류였다. 최근 드라마·영화·가요 등의 대중문화가 중국·일본·동남아·중동 등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한류’ 열풍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백제풍 문화가 일본에 압도적으로 많이 수출됐던 것이다. 사실 삼국 중 그다지 큰 인상을 주지 못하는 나라가 백제다. 고구려는 만주 벌판을 지배한 대륙의 주인으로, 신라는 삼국전쟁의 승자로 우리 기억에 남아 있다. 반면 백제는 고구려에 밀리며 수도까지 한강 유역에서 웅진(공주)과 사비(부여)로 옮겨야 했고, 후반에는 신라에까지 열세를 보이다 멸망했다. 그렇다고 신라처럼 많은 문화유산을 남겨놓지도 못했다. 패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제의 대외교류사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백제는 중국과 일본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백제는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중국 해안 지방에 거점을 마련했는데, 이는 신라가 당에 신라방을 설치하기 훨씬 전인 4세기의 일이다. 남북조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대륙의 힘이 공백 상태가 되자, 백제의 귀족들은 자체 무장력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해, ‘백제군’ 또는 ‘진평현’이란 군현을 설치해 거점으로 활용했다. 이 거점을 통해 백제인들은 중국·백제 간 무역과, 백제·중국·일본을 잇는 중계무역을 주도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조 간의 대립 상황에서 남조의 정통 왕조를 돕는 정치적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중국의 문헌인 <송서>나 <남제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른바 ‘요서경략설’(遼西經略說)이다.  일본 나라의 백제식 가옥에서 출토된 토기류. 사진 권오영 한신대 교수 제공 백제의 대외 진출과 교류에서 그 자취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일본이다. 일본인이 ‘도래인’(渡來人)이라 부르는 이주자의 다수는 백제인이었다.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이 고대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 불교를 처음 전해준 사람도 백제의 성왕이 보낸 노리사치계였다. 노리사치계는 불상과 경전을 가지고 일본에 가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백제는 그 뒤 577년(위덕왕 24)에 불상 만드는 기술자와 절 건축자를 보냈고, 이어 금속공예사, 기와 굽는 기술자까지 보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절 짓는 목수는 ‘사사’(寺師), 기와 굽는 이는 ‘와(瓦)박사’, 탑의 상륜부를 만드는 이는 ‘노반(?盤)박사’ 등으로 불렸다. 기술자들이 박사나 스승 등의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일본에서 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짐작되는 호칭이다. 한편 이보다 한참 전인 284년 무렵에도 백제의 아직기와 왕인은 <논어>와 <천자문>을 전했으며, 태자의 스승과 사관이 되어 최초로 역사 기록을 맡기도 했다. 513년부터는 오경박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했다. <시경> <상서> <주역> <예기> <춘추> 등 유학의 기본 경전인 오경에 밝은 학자인 오경박사는 국가의 지배이념이랄 수 있는 유교사상을 수십 년에 걸쳐 전파했다. 백제는 학문적인 전수 말고도 의학, 역학, 천문, 지리, 점술 등도 전파했다. 이런 백제인의 문화 전파는 일본의 고대국가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일본인들이 고대사 최고의 인물로 평가하는 이는 7세기 초 스이코 천황의 섭정이었던 쇼토쿠 태자다. 그는 귀족들이 전횡하는 일본 황실에서 천황의 권력을 강화해 고대국가 체제를 완성시키고 아스카 문화를 연 주역이다. 일본에 불교가 전파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불교는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부족제도를 초월한 보편적 교의를 가진 차원 높은 종교다. 이 때문에 불교의 수용은 씨성(氏姓)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호족 연합의 야마토 정권을 중앙집권적 율령국가로 개혁하는 이념적 장치가 되었다. 쇼토쿠 태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불교 수용을 위해 아스카 문화의 상징이자 세계 최고(最古)의 목조건축물인 호류지(法隆寺)를 창건했다. 쇼토쿠 태자의 스승 역시 고구려의 승려 혜자와 백제에서 온 도래인이었다. 쇼토쿠 태자와 당시 개혁 세력에 섰던 소가씨 집안은 도래인의 협력으로 아스카 문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일본 고대국가 체제 형성에 백제는 이처럼 결정적인 뼈대 구실을 했다. 지금의 한류 역시 세계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미국과 일본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입하던 것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중국 것을 수입해 개발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류 역시 우리만의 원천 기술이라기보다는 수입·가공해 그 뿌리가 단단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만의 원천 기술을 가질 때 단단한 생명력과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럴 때 찬란했던 백제 문화와 그 수출의 역사는 내일을 위한 성찰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 최용범 역사작가·<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저자 |
|||
교과서가 미워하는 백제 역사 - 백제, 그 이후 중흥기 역사 생략한 채 멸망에만 방점…황국사관 무비판적 수용도  ‘공주 송산리 고분군’(262쪽)이라고 설명이 붙었지만 기실은 ‘송산리 고분군 모형관’ 사진을 잘못 게재한 것이다. 2002년 초판에서 송산리 고분군 사진을 제대로 게재한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개악이 되었다. 중등교육에서 국사는 올바른 국민적 정체성 확립과 다양한 사관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서해 바다의 ‘황해’ 표기처럼 자기 인식의 부재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 더구나 ‘남해’는 표시도 되지 않았다. 삼국시대 백제사 서술 부분 또한 심각한 오류들이 보인다. 우선 건국설화와 관련된 부분을 꼽을 수 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백제 건국 집단을 “백제는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의 결합으로 성립되었는데”(47쪽), “고구려 주몽의 아들로 알려진 온조가 남하하여”(47쪽)라고 했다. 이대로라면 백제 건국 세력은 고구려 계통이 되지만, 이와 다른 기록이 훨씬 많다. 가령 <삼국사기>에는 온조 설화 외에도 북부여 계통인 비류 시조 설화를 함께 수록했다. 중국이나 일본 문헌에서 백제 시조라는 구태나 도모대왕은 부여 계통이었다. 더구나 백제인이 시조로 인식한 동명왕은 고구려가 아니라 기실은 부여의 시조였다. 472년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에서는 “저희는 근원이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고 해 자국의 근원이 부여임을 분명히 했다. 백제 왕실의 씨(氏)인 부여씨의 내력을 <삼국사기>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내려왔기에 부여로 씨를 삼았다”고 했다. 실제 부여씨는 370년께 부여 왕실의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중국 역사서에서 백제를 부여의 별종(別種)이라고 해, 백제 건국 세력을 부여의 한 갈래로 인식했다. 그 밖에 성왕은 사비성 천도와 더불어 남부여로의 개호(改號)를 통해 부여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법통 계승을 천명했다.  »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2002년 초판 본문에서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하면서”(59쪽)라고 했지만, 이 지도에서는 ‘사비성’을 임존성이나 주류성과 함께 ‘백제 부흥운동 중심지’로 부각시키는 모순이 보인다. 더구나 명색이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 세력’이라는 이름의 지도이건만 ‘통일신라’로 표기됐다. ‘통일신라’는 백제 땅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한반도에서 당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낸 676년 이후라야 가능한 용어다. 재판에서 수정했다지만 이런 명백한 오류가 4년간이나 버젓이 통용됐다. 뿌리는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 요컨대 당시 백제인들은 자국의 기원을 일관되게 부여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교과서에는 이런 사실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백제 건국 세력을 고구려 계통으로만 간주하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열등감을 지녔다는 허황된 주장까지 나왔다. 이렇듯 백제 건국 세력에 대한 편중된 서술은 백제사에 대한 편견의 단초가 되었다. 두 번째로 성왕의 관산성 패사(554년) 이후 위덕왕이나 무왕과 의자왕대에 이르는 무려 100여 년에 걸친 국력 회복과 군사적 성취에 대해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이 멸망으로 넘어간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51~54쪽). 이 기간에 백제는 불교 이념을 적절히 이용해 강력한 왕권 구축과 익산 천도 추진, 동양 최대의 가람인 미륵사 창건, 신라에 대한 군사적 공세로 넓은 영역 확보라는 괄목할 만한 팽창을 이뤘다. 교과서가 이런 내용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백제 멸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저변에 깔리게 한 요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 국사 교과서에서는 백제의 멸망을 “이미 내부적으로 정치 질서의 문란과 지배층의 향락으로 국가적 일체감을 상실한 백제는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54쪽)라고 기술했다. 백제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이 문구에는 은연중 백제는 멸망함으로써 ‘질서의 문란’과 ‘지배층의 향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왜곡될 소지마저 있다. 백제 멸망이 억압의 해방! 물론 이런 기술이 백제 멸망의 온전한 배경이 될 수는 없다. 당대에 100여 개 신라 성을 점령해 승전에 도취한 의자왕의 자만심, 신라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당나라 세력의 유인과 국제 정세 급변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백제 멸망의 1차적 요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54쪽)고 해 변변한 항전도 없이 백제가 역사 무대에서 사라진 것처럼 서술했다. 그러나 이는 풍왕을 수반으로 하는 백제가 복구됐기에 그 멸망을 663년 백강 전투까지로 지목한 조선 후기 이래의 인식과도 배치된다. 백제인의 국가회복운동을 교과서에서는 ‘백제부흥운동’(54쪽)으로 명명했다. 그런데 ‘부흥’은 중흥 개념일 뿐 탈취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이 용어는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일본왕(천황)이 멸망한 임나의 재건을 지시했다는 ‘임나부흥’의 ‘부흥’에서 비롯됐다. 즉, ‘백제부흥운동’이라는 용어는 종주권자인 천황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백제를 감히 멸망시킬 수 없다는 황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다. 천황권의 엄존을 과시하려는 입장에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연구자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를 답습한 것이다. 또한 교과서는 ‘삼국의 경제생활’에서 백제의 대외 진출과 관련해 “백제는 남중국 및 왜와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136쪽)고만 기술했다. 그런데 백제가 수군을 정비해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고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했다면(49쪽), 그 이상의 풍부한 문헌 사료와 물적 증거를 지닌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의아하다. 국제성을 띤 백제 문화의 공간적인 토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백제의 국제성 반영 못해 게다가 칠지도를 ‘금속기술의 발달’(260쪽)에 수록해 제철기술의 우수함만 언급함으로써 이 칼이 지닌 정치적 위상을 사장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삼국 가운데 백제가 정치·문화적으로 가장 ‘빈약’하다는 인상만 심어준 것이다. 후대에 여러 차례 걸러진 역사서보다는 백제인들의 사고와 정서가 담긴 당대의 자료를 십분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특히 역사 교육은 그 수용자에게 왜곡되거나 편견에 사로잡힌 역사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국사 교과서의 백제 관련 서술은 백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역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아울러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제대로 빠르게 반영하려는 교과서 집필진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도학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
|||
관용으로 이룬 무지개 공동체 - 동아시아의 디오게네스,백제인 가장 국제적이고 가장 미래지향적이던 다문화 사람들  백제에는 사람이 살았다. 이 빤해 보이는 말은, 그러나 하나 마나 한 말이 아니다. 생각해보자. 우리의 상상력에 포착된 고대인의 삶은 대개 무채색이 아닌가. 신라와 고구려 사람들에 견줘 백제 사람들의 이미지는 더욱 그렇다. 백제인의 삶에 대한 기록이 두 나라 사람들의 그것에 비해 태부족인 탓도 있겠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단조롭거나 따분하지 않았다. 전화(戰禍)에 시달리느라 그럴 틈이 없었을지 모른다? 아니다. 백제인의 삶은 결코 공포로 얼룩지지 않았다. 백제인은 당대 삼국은 물론 동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는 국제화됐지만 국제적이지 않고, 열심히 미래에 투자하지만 현재를 무한정 유예할 뿐이지 않은가. 그래서 1400년 전 백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지금 여기’의 문제다. 외국인과 어울려 살다 중국 사서인 <수서> 백제전을 보면, 백제에는 신라인·고구려인·왜국인을 비롯해 중국인도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백제는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도 백제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도왔다. 이들은 일반 백제인들과는 달리 종족별로 특별히 관리될 만큼 종족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귀화인들에게는 일정 기간 세금 면제와 토지 소유 등 사회적 특권이 주어졌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 부여 궁남지에서 발견된 목간의 ‘부이’(部夷)라는 기록이 눈길을 끈다. 부이는 귀화인의 집단 거주지를 뜻하는 것으로 사비도성 안의 ‘서부 후항’에 귀화인들의 특별 거주지가 설정된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백제는 다양한 계통의 사람들이 공존했고, 종족적·문화적 정체성 역시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백제는 외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다. 이는 신라나 고구려와 뚜렷하게 비교되는 국가적 특성이었다. 신라는 폐쇄적인 골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각 신분층 간에 여러 제약이 뒤따라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고구려는 다종족 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자존적인 천하관에 안주한 채 중국과 오랫동안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통성을 고수하는 데 급급했다. 100만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단일민족이라는 순수한 혈통 논리에 의해 다문화 사회 진입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구상에 단일민족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해방 직후 일제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의 내적 통합과 장차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단일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운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점점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변모해나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런 폐쇄적 인식은 버려야 할 것이다. 생산력 발전에 힘쓴 백제인들 백제인들의 생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건 농업이었다. 백제는 기후가 온난하고 강수량이 풍부하며, 지리적으로 한강·금강·영산강 유역에 비옥한 곡창지대를 품고 있어서 삼국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는 자연조건을 가졌던 덕분이다. 그러나 자연조건에만 의지하지 않고, 국가재정 확보와 민생 안정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권농 정책을 시행했다. 저수지 축조와 함께 하천 범람을 막는 제방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농경지를 개척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다. 330년경에 만든 전북 김제 벽골제 축조가 좋은 예다. 벽골제는 길이가 약 3km고, 제방 높이는 4.3m로 연인원 32만2500여 명이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과 나뭇가지를 층층이 싸서 다지는 이른바 ‘부엽공법’을 이용한 것도 눈에 띈다. 이 공법은 서울 풍납토성이나 부여 부소산성 성벽 축조에도 사용된 당시 높은 수준의 토목기술이었다. 중국에서는 이미 안휘성 수현의 안풍당 유적에서 부엽 공법이 확인된 바 있고, 일본 오사카의 사야마이케(狹山池)는 백제의 선진 부엽공법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철제 농기구를 확대 보급하고 농사일에 우경을 실시했다. 백제의 농기구로는 논밭을 가는 따비·쇠괭이·쇠삽날, 그리고 수확구인 작은 칼과 낫·쇠스랑 등이 사용됐다. 이후 논밭갈이 기구인 ‘U’자형 쇠삽날과 쇠스랑, 중경 제초 작업에 사용된 쇠괭이·호미·살포 등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철제 농기구들은 농경지 개간과 경작 규모의 확대, 작업 능률 향상을 한껏 부추겨 농업 생산력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  나무 자루 달린 괭이 / 나무 괭이 / 천계형 주전자 소에다 쟁기를 매어 밭을 가는 우경은 농업 생산의 획기적인 기술 변화로 간주된다. 가축력을 이용해 우경을 할 경우 깊이갈이가 가능해져 종전보다 2.4배의 노동생산력이 향상되고, 아울러 토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따라서 우경의 보급과 확대 실시는 작업 효율을 크게 높여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1인당 경적 면적도 확대시켰다. 대전법(代田法)과 간단관개법(間斷灌漑法) 같은 새로운 농업경영 방식도 도입됐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하층밭 유구에서 보듯이, 이랑과 고랑에 교대로 파종하는 방식인 대전법은 후경 없이 해마다 밭농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물을 넣고 빼는 방법을 써서 물로 김을 매는 오늘날의 간단관개법이나 습전을 건전으로 만드는 영농 방식으로 농업 생산력을 높인 것도 백제의 눈에 띄는 선진 농법이었다. 이런 농법들은 백제 이주민들에 의해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농업 생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하내 지방의 상습지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곳곳에 저수지와 수리 관개시설을 만들고 농업 생산력을 종전보다 단위 면적당 3배나 늘려 5세기에 이른바 ‘농업혁명’을 이뤘다고 한다.  충남 논산 마전리의 청동기시대 논 지배층의 놀이, 일반 백성의 축제 백제의 신분층은 크게 지배층인 왕과 귀족, 평민층, 그리고 천민으로 나누어진다. 왕과 귀족들은 관직과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배 세력이었다. 그들은 수도인 왕경에 거주했고, 정치·경제·문화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백제는 유명한 가문으로 왕족인 부여씨 외에 사씨·연씨·협씨·해씨·진씨·국씨·목씨·백씨의 8개 대성귀족이 있었다. 지배층은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놀이문화도 독점했다. 중국 역사서에 백제인이 좋아하는 놀이 풍속으로 바둑·장기·투호·악삭·농주·저포와 윷놀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다. 투호는 화살을 항아리에 던져 넣는 놀이이고, 악삭은 주사위 놀이이며, 농주는 곡예사들의 재주에 해당한다. 지배층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사냥과 바둑이었다. 사냥은 무술을 익히기 위한 놀이였으며, 활쏘기 실력은 국왕이 되는 데 중요한 재능으로 받아들여졌다. 바둑은 백제 상류사회에서 크게 유행한 놀이였다. 제21대 개로왕이 바둑내기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고구려가 밀파한 간첩 도림의 꾀에 빠져 왕도 한성을 상실하고 자신의 목숨마저 잃을 정도의 국난을 겪었던 일화는 유명하다. 신선놀음에 미쳐 나라를 망친 꼴이 된 것이다. 반면 일반 백성들은 촌락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고 각종 공사에 동원됐다. 그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부유한 자의 토지를 빌려 경작했다. 백성의 세금은 토지세에 해당하는 조세와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공물세, 그리고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노동력 징발이 있었다. 백제는 한 해 농사의 풍흉에 따라 차등 징수했는데, 쌀과 옷감 원료인 베·견직물·삼베 등 현물로 징수했다. 군역은 3년이 원칙이었으나 잦은 전쟁으로 백성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백성들이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재난을 당하면 생존 기반을 상실해 결국 유민의 신세가 되었는데, 이는 사회 불안 요소일 뿐 아니라 국가재정에 큰 위협이 됐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여러 시책을 강구했다. 6세기 초 무령왕대에 시행한 수리 제방시설 축조·정비 사업이 좋은 예다. 유민들의 귀농 조처는 곧 농업 노동력 확보를 뜻하는 동시에, 조세 징수와 노동력 징발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일반 백성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기 위한 집단적인 축제를 열었다. 지배층들이 놀이문화를 독점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명절이나 세시풍속을 통해 지친 삶의 애환을 달랬다. 백제의 토착적인 세시풍속으로는 5월과 10월에 행하는 농경의례와 12간지에 맞춰 행하는 세시풍속 등이 있었다. 이는 풍년 기원과 추수 감사에 집중된 벼농사 생활권의 세시풍속이다. 일반 백성들은 지배층처럼 붉은색·자주색 비단옷을 입지 못하고, 주로 삼베나 갈대를 엮어서 만든 흰색 의복을 즐겨 입었다.  충남 공주 하봉리와 전남 화순 용강리의 쇠낫 더 넓은 세상으로 백제는 강과 바다로 이어진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해외 활동에 적극 나섰다. 한강·금강 등 큰 강과 서해·남해를 연결하는 내륙과 연안 수로 교통망은 백제의 대외활동을 촉진하는 좋은 조건이었다. 강은 비옥한 평야가 열려 있어 농업생산력이 매우 풍부하고, 자연의 방어시설이 되며, 수량이 풍부해 서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운 교통로와 교역로 기능을 했다. 한강과 금강에 도읍지를 정한 것도 이런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해 국가 발전의 전기가 됐다. 아울러 서해를 통해 중국 남조와 일본열도의 왜를 연결하는 해상 활동을 전개해 국가 발전의 터전으로 삼았다. 이처럼 백제가 활발한 대외 교섭에 나선 데는 왕권 강화를 통한 정치적 안정과 격화되던 고구려와의 항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배경이 깔려 있다. 웅진 시기(475~538)에 중국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공주 무령왕릉이다. 이 시기는 웅진 천도 직후의 정치적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고구려에 대해 공세적이 될 정도로 정치적 안정을 찾은 때였다. 무령왕릉의 구조가 중국 남조의 묘제를 모방했고, 묘지와 매지권 등 남조의 매장 관행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를 통해 무령왕대에 백제 지배층이 중국 남조 문화에 경도됐을 정도로 남조 문물을 적극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사비 시기(538~660)에는 남조뿐 아니라 북조와의 교류도 활발했다. 6세기 후반 위덕왕대에는 남조 청자만이 아니라 북조계의 자기도 유입됐다. 부여 정림사지와 능사에서 출토된 농관을 쓴 도용(籠冠陶俑)은 북위 영녕사(永寧寺)의 것과 거의 같다. 이는 위덕왕대에 남북조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조 이외에 북조 국가인 북제·북주에까지 교섭 관계를 넓혔음을 보여준다.  4~6세기 백제의 세력 및 활동. 사진 사계절 출판사 제공 수입, 백제화, 수출, 집단 이주 백제인은 문물의 수입뿐 아니라 수출도 활발히 했다. 새로 수용한 선진 문화를 개성이 있는 자기 문화로 변모시켜 이웃 신라나 가야, 그리고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에 전파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했다. 백제는 역사적으로 왜와 깊은 우호관계를 맺었다. 단순한 문물 교류에 그친 게 아니라 많은 주민이 집단 이주함으로써 일본에 직접 선진 기술과 고급 문화를 이식했고, 이는 일본 고대국가 수립과 고대문화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지배층 간에 권력다툼이 심화되고 고구려의 남진 공세가 격화되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일본열도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었다. 5세기 후반에는 개로왕의 동생인 곤지가 17년 동안 왜에 체류하면서 왜가 친백제 노선을 유지하도록 외교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백제계 이주민을 통솔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왜인이 백제에 건너와 관료로 활동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백제의 중심부와 영산강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왜계 고분과 문물이 출현했다. 공주 단지리의 왜계 횡혈묘와 영산강 유역의 전방 후원형 고분과 왜계 유물들이 이런 교류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백제와 왜의 긴밀한 관계가 6세기 이후에도 이어진다. 백제는 왜에 고대국가 통치 기술과 지배 이념 확립에 필요한 새로운 선진 문물을 제공했고, 왜는 반대급부로 백제에 유사시에 약간의 군사와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 시기 양국 관계에는 물적 교류 못지않게 인적 교류도 활발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많은 이주민들이 일본열도에 건너갔다. 이들이 지니고 있던 선진 기술과 지식, 그리고 불교·유학·도가사상·천문·역법 등 고도의 정신문화 요소는 일본 고대국가의 성립과 고대문화의 바탕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주민 중에 왜 왕권과 관계를 가지며 두드러진 역할을 한 유력한 씨족들이 나타났는데, 진씨(秦氏)·동한씨(東漢氏)·서한씨(西漢氏)·길사집단(吉士集團)·소아씨(蘇我氏) 등이 유명하다. 특히 소아씨는 웅진 천도 때 문주왕을 보필했던 목협만치(木?滿致)와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는 병관좌평 해구와 권력을 다투다 패하자 많은 주민들과 함께 왜로 망명했다. 소아씨는 6~7세기 중엽 천황의 외척이 돼 왜 왕권 최대의 정치 세력을 형성한 백제계 이주민 출신이었다. 소아씨는 백제로부터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불교를 흥륭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양기석 충북대 교수·한국고대사 |
|||
백제인의 열린 개혁 정신 호남벌 타고 뻗어나는 진취적 기상 속에 팽창 야욕 절제하는 미덕  산수산경 무늬 전돌 백제는 한강의 중류와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의 백제는 한반도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한강 유역의 대부분은 물론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까지 확보했다. 백제는 한강 유역과 한반도의 서·남해안 지역에서 해양을 통한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또한 고구려를 통해 북방의 대륙문화도 대거 들여왔다. 강과 평야 따라 선진문화 전파 한강 유역뿐만 아니라 호남벌은 강이 많고 평야로 이뤄졌다. 이 점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으로 둘러싸인 신라 지역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강을 따라 평야 지대로 이동하는 백제 지역에서는 문화의 전파와 교류가 빨랐다. 반면 신라 지역은 험준한 산맥으로 가로막혀, 대륙의 선진 기술문화가 늦게 도입됐다. 백제 지역으로 내려오는 이주민들은 큰 세력 집단을 형성했고, 우수한 기술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이 토착사회를 선도하고 그 문화를 개발시켰다. 반대로 산맥을 넘어 신라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거의가 토착 세력에 흡수됐다. 지방에 웅거한 토착귀족이 중심이 되어 이룩한 신라 사회에는 보수 성향의 의식이 성립됐다. 주류를 형성한 이주민 세력은 백제 사회에 정착하는 한편, 다른 곳을 찾아 떠나가기도 했다. 삼국시대의 문화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해지는 것이 추세였지만, 특히 백제는 유학이나 불교를 일본에 능동적으로 전해주었다. 대륙에서 선진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자기 문화를 수립하고, 그것을 또 다른 곳으로 전해주는 과정에서 백제인들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의 의식을 성립했다. 교류가 빈번한 백제 사회에는 이미 중국의 남북조는 물론 변방민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풍부한 문물이 들어와 있었다. 신라에 비하면 조그만 가족묘에 불과한 무령왕릉에서 무려 88종 2561점의 유물이 쏟아져나왔다. 이렇듯 알찬 문물을 바탕으로 이뤄진 체제 정비는 귀족문화를 세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없이 다양한 문화를 종합하거나 방대한 영역을 통할하기 위해, 백제인들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규율 속의 절제 의식을 성립시켰다. 일찍이 주위를 정복해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 또는 선진의 개방된 문화가 한강 유역에서 호남벌을 타고 뻗어 내려올 때의 진취적 기상 속에, 백제인의 도도한 맥박과 패기가 숨어 있었다. 그 속에 노출된 백제 문화의 웅혼한 모습은 세련된 귀족문화의 발달로 조밀하게 정비되면서 우아하거나 아담하게 갖춰져갔다. 개혁이 추구하는 이상 웅진 시대의 백제 불교에서 미륵신앙과 함께 계율이 강조되는 분위기는 시사점을 준다. 미륵신앙은 백제의 공인 불교에서도 수용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웅진 시대에 오히려 크게 유행했다. 본래 미륵정토 신앙은 현실 사회를 개혁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현실 사회의 혼란을 부각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엄격한 계율을 강조한다. 그러나 백제 미륵신앙은 혼란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이에 따른 현실 사회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다. 피난 수도에서의 혼란을 지적하면, 이로 말미암아 백제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냥도구를 불사르고 가축을 방생하는 등 형식에 흐를 정도로 엄격한 계율을 강조한 것은 사회의 혼란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개혁 의지를 보이고는 이상사회의 도래를 꿈꾸게 했다. 이렇듯 강조하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점차 부상하는 개혁 의지는 백제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 점은 전륜성왕(인도 신화 속의 임금. 정법(正法)으로 온 세계를 통솔한다고 한다)의 치세를 강조하면서 정복국가 체제를 갖추려 한 신라의 경우와 비교된다. 성왕은 전륜성왕을 자처하면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 했다. 백제의 절제 정신은 도가사상의 유행을 가능하게 했다. 오직 스스로 절제하는 것만이 바로 도를 좇는 일이요, 덕을 두텁게 쌓는 방도가 된다. 도가사상의 유행은 신선사상을 가져오게 해, 신선이 거주한다는 동래·방장·영주의 삼산을 백제 사회에 구축했다. 곧 사비도성의 일산(日山)·오산(吳山)·부산(浮山)에 선인이 거주하면서 조석으로 서로 왕래한다고 했다. 이는 이상사회의 건설과 바로 연결이 가능한 것이다. 무왕은 634년 신선사상에 의거해 연못과 방장산을 조성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망해루나 망해정을 세우고 거기에서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방격규구신수문경(方格規矩神獸文鏡)에는 선인이 옥천(玉泉)을 마시고 대추를 먹음으로써 늙지 않고 영구히 산다고 했다. 산경문전이나 금동용봉봉래산향로 등의 유물에는 중첩된 산 사이사이에 수목은 물론 용과 봉황이나 기린 등이 신선과 함께 노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향로나 벽돌, 거울을 제작하면서 백제인들은 가슴속 이상향을 은근히 드러냈다. 통합 속에 심은 충절 백제 불교에서 신라의 화엄사상 같은 융합적인 사상을 쉽게 찾아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백제의 사상에서도 통합적인 성격을 찾을 수 있다. 법화사상은 이런 면을 알려준다. 웅진 시대 이후 중앙집권 체제를 성공적으로 정비하면서, 백제 왕실이 귀족세력과의 연합을 모색하려는 사회 분위기와 연관해 법화신앙이 유행했다. 백제 왕실이 <법화경>의 보문품을 강조했다면, 귀족인 사택지적(砂宅智積) 등은 법화의 대통불사상을 수용했다. 또한 관음 영험신앙은 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백제의 법화신앙은 사회계층 통합에 어울렸다. 백제의 법화신앙은 삼관법을 하나로 파악하려는 강력한 융합사상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화경>에서 표방된 회삼귀일(會三歸一) 사상의 전통을 지녔다. 그리하여 관음의 영험신앙과 법화삼매를 함께 추구했다. 이는 관음 영험신앙의 전통을 더 강조하면서, 통합적인 사상 경향을 가질 수 있게 했다. 백제의 통합 사상은 유교를 통해서도 진작돼 국가에 대한 충절 정신을 낳게 했다. 백제는 중국을 통해 오경이나 <자사> <모시> 등의 경전을 받아들였으며, 주로 남조의 예학을 수용했다. 이미 4세기경에 사용된 목간에는 <논어>의 일부가 기록됐다. 유학의 예학은 백제인의 윤리 의식을 갖추게 하면서 실천적 성향을 드러냈다. 민족문화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백제 문화는 민족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삼국 문화를 합쳐 통일신라 시대에 민족문화를 형성했다. 비교적 온전하게 전하는 신라 문화와 비교해, 많이 훼손돼 원형을 잃은 백제 문화의 완전한 모습을 복원해야 한다. 일그러진 백제 문화로 민족문화를 바르게 제시할 수는 없다. 아울러 거대하게 의미를 붙이기보다는, 백제 문화를 민족문화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백제인들의 사상적 특성으로 개방과 진취적 정신, 이상을 추구하는 개혁 성향 등을 들었지만, 이 또한 민족문화 속에 융화돼 우리 민족의 정서로 이어져 내려왔다. 후대에 편찬되면서 백제사에는 윤색되고 공백으로 남은 부분이 많다. 한성 시대에 정복국가 체제를 갖추면서, 호남벌을 따라 뻗어나갈 때의 패기라든가 사회 결집을 위한 통합 의식 등은 애써 다뤄야 할 문제다. 김두진 국민대 교수·국사학 |
|||
부여에 뿌리 두고 동아시아로 뻗어가다 - 동아시아의 디오게네스,백제인 일본 왕실이 흠모하고 백성들이 선망한 백제인  부여에 뿌리 두고 동아시아로 뻗어가다. 출판사 <수막새> 제공 백제 멸망 뒤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주류성과 임존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란 국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이후 백제 유민은 신라에 편입돼 신라인으로 살아가거나 당과 일본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 사비성이 함락된 직후 소정방이 백제왕 및 왕족·신료 93명과 백성 1만2천 명을 데리고 당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또한 <일본서기>에는 백제 멸망 뒤 4천 명에 이르는 백제인이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로 이주해갔다고 한다. 나라는 망했지만 백제인과 백제 문화의 불씨마저 꺼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은 새로이 맞닥뜨린 낯선 문화적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지켜갔고, 또 어떻게 새로운 문화와 융합해나갔을까? 백제인에게 계승된 부여 백제는 마한 소국 연맹체 가운데 한 나라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온조와 비류는 고구려 건국자인 주몽과 졸본부여 왕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북부여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함께 남하해 형 비류는 미추홀에,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정착해 ‘십제’(十濟)라고 했다. 비류가 죽은 뒤 그의 무리를 통합한 온조는 모든 백성이 즐겁게 따랐다고 하여 국호를 ‘백제’로 바꾸었다. 즉, 백제는 주몽(동명)을 족조(族祖)로 하는 졸본부여계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한성 시기 온조왕대는 동명성왕을 시조로 모신 사당이 세워지고 왕실은 ‘부여씨’를 칭했다. 웅진 시기 개로왕은 북위에 보내는 국서에서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음을 강조한다. 또한 성왕은 아버지 무령왕에 이어 적극적으로 대고구려 정책을 추진했고, 사비로 천도해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뒤 새로운 사비 시대를 열었다. 성왕은 대내외적으로 부여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나라로 자처했던 것이다. 한성, 웅진, 사비로 비록 도읍을 옮겼지만 백제인에게는 부여 계승 의식이 면면히 이어져왔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백제와 일본의 교류는 백제 아신왕 6년(397)에 왕이 왜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태자 전지(?支)를 볼모로 보냈다는 기록에 의한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침략을 받은 직후였다. 전지가 귀국해 왕으로 즉위한 뒤 <일본서기>에는 전지왕이 그의 누이 신제도원(新齊都媛)을 왜국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 또 백제가 개로왕의 동생 곤지(昆支)를 왜국에 파견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곤지는 16년 동안 체류한 뒤 귀국하지만 그가 체재했던 일본 가아치국(河內國) 아스카군(安宿郡)에는 그를 모시는 아스카베신사(飛鳥戶神社)가 있다.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에 따르면, 그는 일본의 아스카베노미야스코씨(飛鳥戶造氏)의 조상이다. 이 신사의 주변에는 고분 100여 기가 있는데 아스카베천총(飛鳥千塚)이라 불린다. 이 횡혈식 석실분은 일본에는 그 이전에 없던 분묘로 백제로부터 도입된 새로운 형식이었다. 일본 고분 시대에 많이 축조된 전방후원분이 점차 감소되면서 5세기 중반 백제 지배계급의 묘제였던 횡혈식 석실분이 도입되고 6세기 일본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단순한 무덤 구조만의 변화가 아니라 함께 토기를 묻는 부장품의 풍습과 장송 의례 절차의 변화를 의미했다.  (위)백제인이 주축이 되어 건립한 일본 동대사와 대불(아래). 일본을 감화시킨 백제 학자와 승려들 5∼6세기에는 한반도로부터 철기·도자기 제작 기술, 금공·토목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이 전파됐고, 백제 토기는 일본 토기 스에키(須惠器)가 만들어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로소 일본에서 높은 온도의 가마를 이용한 경질토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백제 금공예품 제작 기술의 전파를 보여주는 것은 금동제 신발과 장식대도, 귀면문 허리띠 등을 들 수 있다. 무령왕과 성왕은 중국 남조를 통해 선진 문물을 수입하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백제는 왜국에 불교를 전하고, 오경박사·역박사·의박사·채약사 등을 보낸다. 승려, 기술자 집단 등 인적 교류가 진행되면서 이들을 통해 다양한 선진 문물이 전해졌다. 왜는 백제에 군사력 지원으로 보답했다. 왜는 478년 이후 120여 년간 중국과 교류가 단절됐기 때문에 선진 문물의 수입은 거의 백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 시기는 왜의 고대국가 형성기로 백제를 통한 불교의 수용은 지배층의 이념과 의식을 바꿔놓았다. 이렇게 선진 제도가 도입되고, 백제의 학자와 승려 등 선진 인력에 고무돼 왜 왕권의 문화 수준은 크게 향상됐다. 대략 4세기 말부터 백제가 멸망하는 7세기 후반까지 300여 년 동안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이런 양국의 우호적 관계는 백제 멸망 뒤에도 지속돼, 왜는 663년 백제를 구원하기 위한 대규모 원정단을 파견해 백강구 전투를 치르기도 했다. 왕인에 관한 기록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일본 <고서기>(古事記)와 <일본서기>에 남아 있다. 그가 일본에 건너 간 시기엔 논란이 있지만 <논어>와 <천자문>을 가지고 가서 일본에 유교와 한자를 전했다고 한다. 그는 해박한 지식으로 왜국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그는 일본에 문자가 없던 시절 처음으로 한자를 전달한 공으로 일본에서는 크게 추앙받는 인물이 되어 오사카부(大阪府) 히라카타시(枚方市)에 있는 무덤을 비롯해 우에노 공원의 왕인박사비, 왕인신사, 왕인공원 등 그를 기리는 곳이 생겨났다. 왕인의 후손은 가와치노 아야우지씨(西文氏)인데 문필로 이름을 날려 일본 조정에서 일했고 대대로 가와치(河內)에 살았다.  목간 백제인의 후손들 일본을 이끌다 왕인의 후손 가운데는 행기(行基)가 있다. 행기 스님은 나라 시대 최고의 고승으로 일본 왕실 최초의 대승정이 된 인물이다. 행기는 자신을 대승정으로 기용한 쇼무(聖武) 천황의 간청을 따라 도다이지(東大寺)의 비로자나불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평생 대중포교와 사회사업을 병행한 공로로 일본 조정으로부터 ‘대덕’(大德)이란 칭호를 받았으며, 민중으로부터 ‘행기보살’이라고 불리며 부처의 화신으로 숭앙된 인물이었다. <속일본기>에 따르면 의자왕의 아들 선광(善光 또는 禪廣)은 의자왕대 풍장과 함께 조메이(舒明) 천황을 모시도록 보내졌다. 백제 멸망 뒤 복신이 풍장을 맞이해 왕통을 복구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선광은 백제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664년 덴지(天智) 천황은 선광을 백제왕(百濟王)으로 삼고 난바(難波)로 이주시켰다. 691년 지토(持統) 천황은 선광에게 백제왕을 씨성으로 쓰게 했다. 그리고 정광사(正廣肆·종3위 상당)의 관위를 주고 봉호를 100호 주었다. 693년 선광이 사망하자 지토 천황은 그에게 정광삼(正廣參·종2위 상당)으로 추증해 그의 후손에게 음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몬무(文武) 천황은 701년 대보율령을 제정해 백제왕 선광이 거주하던 곳의 행정구역명을 셋쓰국(攝津國) 구다라군(百濟郡)으로 바꾸었다. 이곳에서 백제왕씨는 가장 유력한 세력이 되었고 도다이지의 비로자나불을 세우는 데 큰 활약을 했다. 특히 백제왕 경복(敬福)은 황금 광산을 개발해 쇼무 천황에게 900냥의 금을 헌상하게 된다. 경복의 황금 헌상은 도다이지 대불 조영의 부정적인 여론을 누를 수 있었고, 황통의 권위를 높여준 정치적 의미를 지녔다. 경복은 750년 구나이쿄(宮內卿)가 되어 궁중 업무를 총괄 지휘했다. 이후 백제왕씨는 왜 조정에서 큰 활약을 했고 간무(桓武) 천황대로부터 닌묘(仁明) 천황대까지 백제왕씨의 여자들이 계속 천황의 후궁으로 들어가 그들의 소생이 천황의 아들로 고위직을 차지했다.  (위)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청자 (아래)무령왕릉 청자를 닮은 중국 남경시박물관 청자 일본왕을 옹립하고 폐위한 도목 목협만치(木?滿致)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의 침공으로 한성이 함락됐을 때(475) 문주왕을 모시고 조미걸취(祖彌桀取)와 함께 남쪽으로 간 인물이다. 그 이후 한국의 기록에는 없다가 <일본서기>에 목만치(木滿致)로 등장한다. 이후 그는 왜 왕조에서 재정과 외교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로 등용된다. 그가 만든 새로운 성씨가 소아(蘇我·소가)씨였다. 이후 목협만치는 소아만치(蘇我滿智)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등장한다. 그가 왜에서 거주한 곳은 ‘소가’(曾我)라는 백제인 호족들이 지배하던 고장이었다. 지금의 가시하라시(?原市) 이마이초(今井町)다. 소아씨 가문은 소아만치를 이어 ‘한자(韓子)-고려(高麗)-도목(稻目)-마자(馬子)-입록(入鹿)’으로 계승되고, 특히 도목(稻目)대부터는 일본 왕실의 외척이 되어 천왕의 옹립과 폐위를 좌지우지하며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신선성씨록>(新撰姓氏錄)은 815년에 편찬된 일본 고대 씨족의 실태와 유래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 기록된 씨족의 3분의 1이 한반도계 이주민으로 백제계 씨족 수는 104개다. 백제계 도래인들은 앞에서 말한 백제왕씨의 거주지인 난바와 소아씨의 터전이던 소가 인근, 왕인의 후손이 살던 가와치 등에 많이 모여 살며 백제 도래인촌을 형성했다. 난바에는 백제사(百濟寺)와 백제니사(百濟尼寺)가 세워져 백제인의 정신적 위안처가 되기도 했다. 덴지 천황은 667년 도읍을 오미국(近江國) 오쓰궁(大津宮)으로 옮기는데, 백제가 멸망한 뒤 이주해온 백제 이주민 1천여 명을 새 도읍지로 이주시켰다. 여기에는 백제의 주요 인물들이 포함됐다. 그 이유는 백제인의 선진 지식과 기술을 새 왕도의 건설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덴무 천황은 도래한 백제인에게 10년간의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내리는 등 백제계 도래인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다. 일본 불교의 큰 스승들 성왕대에 일본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점차 일본에도 불사의 건립이 활발해져 일본 최초의 가람 형식을 갖춘 사찰 아스카데라(飛鳥寺)가 지어졌다. <일본서기>에는 이 사찰이 조영될 때(588) 백제에서는 혜총·영근·혜식 등과 함께 불사리(佛舍利)를 보냈고, 사공(寺工)·노반박사(?盤博士)·와박사(瓦博士)·화공(畵工) 등 많은 기술 인력이 파견됐다고 기록돼 있다. 이 사찰은 백제계 도래인의 후손인 소아마자(蘇我馬子)의 발원에 의해 창건됐다. 소아마자는 그의 아들을 사사(寺司)로 임명하고 백제승 혜총을 설법자로 삼았다. 백제의 기술로 만든 이 절이 준공되는 날 소아마자를 비롯한 100여 명의 도래인 후손이 백제 옷을 입고 절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일본서기>에 기록돼 있다. 아스카데라의 대불(大佛)을 안치한 안작조(鞍作鳥) 또한 백제계 도래인이었다. 그는 호류지의 석가삼존상을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호류지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5층 목탑과 금당이 있는데 백제 건축의 영향이 뚜렷하며, 이곳에서 발굴된 기와도 백제 와당과 양식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목조관음보살입상인 구다라관음(百濟觀音)은 일본의 국보로 백제 도래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설과 백제가 7세기 초에 왜 왕실로 만들어 보낸 것이라는 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백제와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쇼무 천황은 지배체제의 강화와 사상의 통일을 꾀하기 위해 지방 사원 체계를 정비하면서 도다이지를 건립하게 된다. 이 절과 비로자나불 주조의 설계와 제작을 지휘한 사람은 백제계 도래인의 후손인 양변(良弁) 스님이었다. 앞서 언급한 행기 스님은 당시 대승정으로 임명돼 도다이지의 불사 사업을 돕고 있었다. 양변은 비로자나불 조영 중 사망해 대불전 바로 앞에 그의 목상이 안치됐다. 당시 공사의 책임자는 국중공마려(國中公麻呂)였는데, 그는 백제에서 건너온 덕솔(德率) 국골부(國骨富)의 손자였다. 일본 고대의 대표적 불교 사찰들이 백제 도래인과 관련됐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백제 것이 아니면 ‘시시하다’… ‘구다라나이’ 일본에는 백제 도래인의 기록과 유적이 많아 남아 있지만 당으로 간 백제 유민의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소정방이 귀국하면서 1만2천여 명의 백제인을 데리고 갔다고 하지만 자취가 알려진 사람은 매우 소수다. 당으로 끌려간 의자왕은 그해 병사해 낙양의 북망산에 묻히고 그의 아들 부여융은 다시 백제 땅으로 돌아와 웅진도독에 임명됐다가 당으로 가서 생을 마감했다. 흑치상지는 사비 함락 뒤 당군에 맞서 싸우다 항복하고 당으로 갔다가 다시 백제 땅으로 돌아와 부여융을 수반으로 하는 웅진도독부의 군장이 되었다. 웅진도독부가 해체된 이후에는 당으로 가서 토번 공격의 선봉에 서서 두각을 나타내다 모반을 꾀했다는 무고로 옥사하고 만다. 흑치상지는 2대 흑치준(黑齒俊)으로 이어진다. 백제 유민 대부분은 군대에 종사하거나 서주와 연주 등 하남 지역에 배치돼 당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에 간 인물 중에는 2·3대에 걸쳐 두각을 나타낸 집안도 몇몇 있지만 그들이 일본의 백제 도래인처럼 씨족을 형성하거나 백제의 유적을 남긴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과 일본에서 살았던 백제 유민들의 자취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당과 일본이 처했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백제는 당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입해,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일본에 선진 문물과 기술을 전해주는 위치에 있었다. 일본의 처지에서 선진 문물의 주인공인 백제인들은 당연히 환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어의 ‘구다라나이’(百濟無い)는 ‘시시하다’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백제(百濟)를 ‘구다라’라고 부른다. 구다라나이는 ‘백제 것이 아니다’는 뜻이다. 고대에 백제의 것이 일본 것보다 훌륭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구다라’라고 불렀던 것이다. <일본서기>에 보면 조메이 천황 10년(638)에 백제천 옆에 백제궁(百濟宮)과 백제대사(百濟大寺)를 짓고, 13년 10월에는 조메이 천황이 백제궁에서 죽었는데, 북쪽에 빈궁을 설치해 이를 백제대빈(百濟大嬪)이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고대 일본의 왕가가 얼마나 백제의 문화를 흠모하고 이를 모방하려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키히토 일왕은 “나 자신으로 말하면, 환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 역사책에 쓰여 있기 때문에 한국과 혈연을 느끼고 있다”(<요미우리신문> 2001년 12월23일치)는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아키히토 왕의 이 발언은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또 유사성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며, 일본에 전해진 백제 문화 속에서 일본 고대문화의 원형이 읽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시사한다. 서윤희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 |
|||
돌아오지 않은 아좌 태자 - 동아시아의 디오게네스,백제인 정치보다 예술 선택···일본에 남아 쇼토쿠 태자 가르쳐 지금이야 일본 1만엔권 화폐의 모델이 일본 근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이지만, 예전 1만엔권의 주인공은 우리에게도 꽤 알려진 쇼토쿠(聖德) 태자(574~622)였다. 쇼토쿠 태자가 누구인가? 그는 일본 고대 아스카(飛鳥) 문화를 꽃피우게 한 주역이 아니던가? 오늘날 일본인에게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쇼토쿠 태자를 꼽는다고 한다. 현재 일본 궁내청에 쇼토쿠 태자의 초상으로 알려진 그림 한 점이 소장돼 있다.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이 그림을 그린 이가 백제에서 온 왕자였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아좌(阿佐) 태자라고 전한다. 백제의 태자가 무슨 연유로 일본까지 와서 쇼토쿠 태자의 초상을 그리게 되었을까?  옛 1만엔권의 쇼토쿠 태자. 위덕왕의 아들로 태어나다 사실 아좌 태자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기록이 거의 없다. 국내에는 생몰 연대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기록한 사서조차 남아 있지 않다. 유일하게 그의 존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역사서는 일본의 <일본서기>(日本書紀)뿐이다. <일본서기>에 백제 위덕왕이 아좌 태자를 일본에 보냈다는 기록 한 줄이 전하고 있다. “스이코(推古) 천황 5년(597년) 4월 여름에 백제왕이 왕자 아좌를 보내 조공했다.” <일본서기>에는 더 이상 아좌 태자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나, 10세기에 편찬된 <성덕태자전력(聖德太子傳曆) 추고(推古) 5년(597년)조>에 아좌 태자가 쇼토쿠 태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아좌 태자가 그림을 잘 그려 쇼토쿠 태자의 초상을 남겼다는 전승이 보이고 있다. 597년경 백제의 통치자는 위덕왕이었다. 그는 사비 백제의 중흥을 이룬 성왕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관산성 전투에서 아버지 성왕이 전사하자 왕위에 오른 그는 치세 초반 귀족들의 권력 장악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산성 패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사정으로 초반에 귀족에게 정치를 맡기며 상황을 관망하던 위덕왕은 주변 국가와의 대외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왕권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성왕의 업적을 기리고 복을 빌기 위한 사찰을 건립하거나, 중국 남조 일변도의 기존 외교정책에서 탈피해 북조와도 통교하는 등 다면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를 펼쳤다. 또한 잠시 소원해졌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경이나 불상 등 불교 문물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아좌 태자의 일본행이 결정됐던 것으로 보인다.  쇼토쿠 태자 초상(일본 궁내청 소장). 아좌 태자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이 작품은 원래의 그림을 후대에 모사(模寫)한 것으로, 원본은 나라현 호류지에 보관돼 있다가 1949년의 대화재로 불타 없어졌다. 쇼토쿠 태자와의 만남 아좌 태자는 위덕왕의 명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곳에서 쇼토쿠 태자와 만나 그의 스승이 된다. 아좌 태자는 어떤 연유로 일본으로 가게 되었을까? 아좌 태자가 일본에 건너간 시기는 597년 4월의 일이었다. 일본의 스이코 천황을 대신해 섭정을 하던 쇼토쿠 태자는 일찍부터 불교에 심취해 큰 사찰을 여럿 세웠는데, 그중 하나인 아스카데라(飛鳥寺·본래 명칭 法興寺)가 8년 여의 긴 공사를 마치고 완성된 것이 596년 11월이었다. 일본은 주변국인 백제와 신라에 그 사실을 알렸고, 마침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던 백제 위덕왕이 아좌 태자를 아스카데라 완공을 축하하는 사신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 사절단의 대표 역할을 맡았을 아좌 태자를 섭정인 쇼토쿠 태자가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여러 번 만남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쇼토쿠 태자는 아좌 태자의 높은 학식과 뛰어난 그림 솜씨에 감탄하게 되었고, 결국 아좌 태자를 스승으로 삼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그들은 인연을 맺었다. 아좌 태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좌 태자가 일본으로 간 뒤 불과 1년 만에 위덕왕이 사망한다. 아좌 태자는 왕위 계승 1순위였으므로, 당연히 백제로 돌아와 왕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지 않았다. 대신 위덕왕의 아우인 혜왕이 70살의 고령으로 즉위했다가 곧 죽고 그의 아들 부여선이 법왕이 되었다. 그렇다면 아좌 태자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일전에 한 지상파 방송사에서 백제 31대 무왕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다. 작가는 아좌 태자의 죽음에 대해 상상력을 통해 흥미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위덕왕이 연로해지자 백제 왕실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벌어졌다. 태자였지만 정치보다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던 아좌와 그의 사촌인 부여선의 갈등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속에서 위덕왕이 아좌 태자를 일본에 사절단으로 보내자 부여선이 이를 이용해 조정을 장악하고, 1년 뒤 위덕왕이 죽자 일본에서 귀국하려던 아좌 태자를 자객을 보내 암살한 뒤 아버지 혜왕을 즉위시킨다는 이야기였다. 위덕왕 말기 정치적 상황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드라마에서 설정한 스토리는 나름대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드라마에서와 같이 설사 아좌 태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가 백제로 돌아올 가능성은 차단됐던 것으로 보인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그가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길은 일본에 남아 쇼토쿠 태자의 스승 노릇을 하면서 쇼토쿠의 초상을 비롯한 여러 그림을 그리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김윤경 천안 입장중 역사교사 |
|||
현대인보다 뜨거웠던 사랑 - 동아시아의 디오게네스,백제인 국경을 초월하고 목숨마저 내던진 백제의 연인들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사랑은 압도적인 소재다. 대중문화가 재현하는 사랑은 차고 넘치는 스펙터클이다. 스펙터클한 대중문화에 휩싸여 사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우문을 던질지도 모른다. 고대인도 사랑을 했을까? 빤한 대답이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사랑을 했다. 다만 사랑도 시대와 문화의 특성을 일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고대의 사랑이 오늘날의 사랑과 똑같은 모습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펙터클해야만 사랑은 아니다. 고대인은 지금보다 훨씬 지독한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 신라인의 사랑 유형에는 지략과 화해의 사랑, 감응과 승화의 사랑, 경계를 초월하는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 (최정선, <신라인들의 사랑>, 프로네시스, 2006). 그렇다면 백제인의 사랑은 어땠을까? 백제 설화로 전해오는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로는 잘 알려진 ‘무왕과 선화 공주’를 비롯해 안장왕과 한씨 미녀’ ‘도미 부인과 개로왕’ ‘아사달과 아사녀’ 등이 있다. 이 사랑 이야기들은 국경을 초월한 사랑, 신의와 정절의 사랑, 기다림과 이별·배려하는 사랑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한마디로 기꺼이 목숨을 거는 사랑이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 무왕(서동)과 선화 공주 무왕과 선화 공주와 관련된 전설은 부여 궁남지, 익산 미륵사지 전설도 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용화산 남쪽 기슭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미륵사터가 남아 있다. 미륵 삼존이 나타난 연못 위에 무왕이 부인의 권유로 지명법사에게 명해 절을 세웠다고 전해지며, 익산시에서는 해마다 서동축제가 열리고 있다. 또한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흥산성에는 ‘사랑나무’로 불리는 400여 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SBS 사극 <서동요>에서 서동과 선화 공주가 사랑을 나누던 곳으로, 새로운 전설의 현장이 되고 있다.  성흥산성 ‘사랑나무’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璋)이다. 어머니가 홀로 되어 집을 서울 남쪽 못가에 짓고 살았는데, 못에 있는 용과 교통해 그를 낳았다. 어릴 때 이름은 서동이며, 도량이 한없이 넓었고 날마다 마를 캐어 팔아 생활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공주 선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서동이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갔다. 그가 서울의 아이들에게 마를 나눠주자, 여러 아이들이 가까이 따랐다. 그는 마침내 이런 노래를 지어 여러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다. 선화 공주님은 남 그윽히 얼어 두고 맛둥방을 밤 몰래 안고 가다. 이 동요가 장안에 퍼져 궁중에까지 알려지니 신하들에 의해 공주가 귀양을 가게 되었다. 공주가 떠나려 할 때 왕후가 순금한 말을 주어 보냈다. 공주가 귀양 가는 길에 서동이 나와서 절을 하고 모시고 가겠다고 하고, 공주는 그가 미더워 따라가게 되었다. 그런 뒤 어머니가 준 금을 내놓으며 함께 백제로 가서 이것으로 생활을 영위하자고 했다. 서동은 “내가 어려서 마를 캐던 곳에는 이것이 진흙처럼 쌓였다”고 하자 공주가 듣고 깜짝 놀라 “이것은 천하의 보배인데 당신이 금이 있는 곳을 알았으니 이 보배를 우리 부모의 궁전으로 보내자”고 했다. 서동이 “좋소” 하고 금을 모으니 그것이 구릉처럼 쌓였다. 서동은 진평왕으로부터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춘향전> 모태가 된 사랑 안장왕과 한씨 미녀 안장왕과 한씨 미녀는 고소설 <춘향전>의 모태가 되었다(신채호)는 백제 미인 한주와 고구려 제22대 안장왕의 극적이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두 사람의 숭고한 사랑은 국경을 넘어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고구려는 백제에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애쓰던 시기(510년대 중반 추정)에 20대 초반의 홍안 태자(후에 안장왕이 됨)를 백제 땅으로 보내 정보 수집 활동을 시킨다. 태자는 지금의 고봉산 일대를 돌아다니다 한씨 성(姓)에 ‘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만나고,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깊은 사랑에 빠진다. 그러던 중 태자의 임무가 끝나고, 태자가 “꼭 돌아온다”는 약속을 남긴 채 다시 고구려로 돌아가면서 이들은 이별의 시간을 맞는다. 생일을 맞은 백제 태수는 미모가 뛰어난 한씨를 불러 수청을 강요하지만 한씨는 “정혼한 사람이 있다”며 한사코 거부하고 정혼자마저 밝히지 않아 옥에 갇힌 채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다. 태수의 명이 내려지는 순간 관아를 에워싸고 있던 광대패들이 갑자기 백제 군사를 공격한다. 고구려 22대 왕이 된 안장왕의 오른팔인 을밀(乙密) 장군 부대가 광대패로 변장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해, 백제 군사와 대접전을 벌이게 된다. 이 와중에 한씨는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온 뒤 고봉산에 올라 봉화를 올려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던 안장왕과 고구려 대군을 기쁨으로 맞이한다. 이후 안장왕은 이 일대를 모두 점령하고 한씨를 고구려로 데리고 가 왕과 왕비가 되어 잘 살았다.  고봉정 신의와 정절의 사랑 도미 부인과 개로왕 도미의 아내는 백제 여성으로 <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유일한 사람이다. <삼국사기>에는 시대적 배경을 개루왕(제4대) 때의 일로 기록했으나, 개루왕은 재위 기간이 128~166년에 해당해 열전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제21대 개로왕(재위455~475)으로 추정된다. 남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절대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랑을 지켜낸 도미 부인의 고귀한사랑 이야기는 오래도록 백제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서 보령시의 도미항을 중심으로 ‘상사봉’ ‘미인도’ 등의 증거물과 함께 오늘도 살아서 전해지고 있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에는 도미 부인의 정절각을 지어 영정을 봉안하고 지금도 그 정절을 높이 기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1984년 5월 창작무용극 <도미부인>으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문화행사 무대에 올려졌고, 그 뒤 18개국에서 100회 이상 공연을 했다.  도미 부인 묘 옛날 백제 개루왕 때였다. 전마들(전마평·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일대)의 군용마를 기르는 목장에 어느 날 임금이 행차를 했다. 그때 임금은 도미의 아내가 천하제일의 미인이라는소리를 듣게 되었다. 워낙 여색을 밝히던 임금이라 신하를 시켜 목수 일을 하는 도미를 불러 말했다.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은근하고 교묘한 말로 꾀면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여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도미가 대답했다. “신의 아내만은 비록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두 마음을 갖지않을 것입니다.” 왕은 이를 시험하고자 도미를 궁궐에 붙잡아두고 신하 한 사람을 왕으로 분장시켜 도미의 집으로 보냈다. 신하는 밤중에 도미의 집에 이르러 도미부인을 불러 말했다. “내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좋아한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도미와 내기를 하였는데, 내가 이겼으므로 너를 얻게 되었다. 내일 너를 후궁으로 삼기로 하였다. 이제부터 네 몸은 짐의 소유가 되었다. 자, 이리 오너라. 어디 한번 안아보자.” 왕으로 분장한 신하가 그녀의 몸을 안으려 하자, 도미의 아내가 말했다. “국왕은 거짓이 없을 것이니, 어찌 제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소서. 소첩이 다시 옷을 갈아입고 곧 들어가 대왕을 모시겠습니다.” 방에서 물러 나온 도미의 아내는 한 계집종을 예쁘게 단장시켜 방으로 들여보내 모시게 했다. 왕은 나중에 그녀가 속인 것을 알고 크게 노했다. 왕은 도미를 불러 사흘 동안 말 1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마구간을 짓게 했다. 사흘째 서산에 지는 해가 한 뼘쯤 남고 마구간이 다 지어졌는데, 임금이 신하를 시켜 마구간의 출입문에 다는 빗장 나무 하나를 몰래 감추게 했다. 임금은 왕명을 어겼다고 노발대발하며 도미의 양쪽 눈을 빼고 조각배에 태워 바다로 떠내려 보냈다. 그러고는 다시 도미의 처를 불러 “네 남편은 이미 죽었다. 오늘 밤 내 시중을 들면 후궁으로 삼겠다”고 했다. 도미의 아내는 얼굴에 밝은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어찌 이런 좋은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하온데 소첩이 지금 월경 중이니 청컨대 몸이 깨끗이 될 때를 기다려 모시고자 하옵니다.” 왕은 그 말을 믿고 이를 허락했을 뿐 아니라 금은 패물까지 두둑이 줘서 며칠 뒤에 다시 오도록 했다. 대궐을 빠져나온 도미의 아내는 그날 저녁에 상사봉(相思峰)으로 올라 도미항 쪽을 바라보며 통곡했다. 이런 연유로 그 산봉우리를 상사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하늘도 무심치 않았던지, 그녀가 상사봉에서 내려와 해안가에 다다르니 한 척의 빈 조각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배를 타고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었더니 천성도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늘의 도우심인가, 그녀는 그곳에서 두 눈을 잃고 장님이 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풀뿌리를 캐 먹으면 연명했지만 행복했다. 그러나 언제 왕의 신하들이 들이 닥칠지 몰라서 늘 불안했다. 마침내 그들은 함께 배를 구해 타고 고구려 땅으로 건너갔다. 고구려 사람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옷과 먹을 것을 나눠주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기다림과 이별, 배려하는 사랑 아사달과 아사 현진건의 장편 역사소설 <무영탑>의 소재가 되었다. 석가탑을 창건할 때 김대성은 당시 가장 뛰어난 석공이라 알려진 백제의 후손 아사달을 불렀다. 아사달이 탑에 온 정성을 기울이는 동안 한해 두해가 흘렀다. 아사녀는 기다리다 못해 불국사로 찾아갔다. 그러나 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자를 들일 수 없다는 금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 아사녀는 날마다 불국사 문 앞을 서성거리며 먼발치로나마 남편을 보고 싶어했다. 이를 보다 못한 스님이 꾀를 내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못이 있소. 지성으로 빈다면 탑 공사가 끝나는 대로 탑의 그림자가 못에 비칠 것이오. 그러면 남편도 볼 수 있을 것이오.” 그 이튿날부터 아사녀는 온종일 못을 들여다보며 탑의 그림자가 비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무심한 수면에는 탑의 그림자가 떠오를 줄 몰랐다. 상심한 아사녀는 고향으로 되돌아갈 기력조차 잃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탑을 완성한 아사달이 아내를 그리워하며 못 주변을 방황하고 있는데, 아내의 모습이 홀연히 앞산 바위에 겹쳐지는게 아닌가. 웃는 듯하다가 사라지고, 또 웃는 모습은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이 되기도 했다. 아사달은 그 바위에 아내의 모습을 새기기 시작했다. 조각을 마친 아사달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나 뒷일은 전해진 바 없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못을 ‘영지’라 부르고 끝내 그림자를 비추지 않은 석가 탑을 ‘무영탑’이라 했다. 백순화 백석대 교수·정보통신학부 |
|||
동아시아 문명의 허브, 무령왕 - 동아시아의 디오게네스,백제인 중국 남조·일본과 교류하며 백제 중흥 이끌어 서기 523년 5월7일. 갑작스러운 비보가 백제 웅진성에 날아들었다. 22년 동안 백제를 통치했던 무령왕의 부음이었다. 순간 백제인들은 475년에 있었던 개로왕의 죽음과 뒤이은 문주왕, 동성왕의 갑작스러운 암살 사건을 떠올리며 또 한 번 나라의 위기가 온 것은 아닐까 긴장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세자(성왕)의 침착한 대응과 순조로운 장례 절차를 보며 안도하고, 비로소 그들 곁을 지켜줬던 무령왕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수도 위례성(한성)을 떠나 웅진으로 향했던 백제인들의 원수를 갚고자 무수히 고구려를 공격했던 왕, 누구보다도 백성을 사랑해 저수지와 제방 수리에 힘써 굶주림을 면하게 해준 왕, 멀리 일본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왕…. 백제인은 그 그리움과 애정을 담아 무령왕릉 축조에 열을 올렸고, 모든 것이 준비된 526년, 3년상을 마친 무령왕의 주검을 왕릉에 안치하고 나서야 비로소 긴 휴식을 할 수 있었다. 조선 시대 <동국여지승람>에는 공주에 두 개의 왕릉이 있다고 쓰여 있었지만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무령왕과 무령왕릉은 긴 세월을 거치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외제 명품을 좋아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잊혀졌던 무령왕릉은 1400여 년이 흐른 1971년 여름, 갑작스레 우리 앞에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처음 사람들을 맞이했던 것은 중국에서 건너와 무덤을 지키는 돌짐승인 진묘수(鎭墓獸)였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지킨 스핑크스와 같은 포스는 없지만 동글동글 귀여우면서도 표정만은 진지한 진묘수의 모습에서 1400여 년 전 백제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쏟아져나온 무령왕릉의 유물은 백제의 혼이 담긴 문화의 결집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유물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된다. “왜 무령왕의 유물에는 이렇게 외국산 제품이 많을까? 무령왕도 외국산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중국산 도자기, 중국에서 주조된 동전,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유리 구슬, 가야식 토기가 있었고 목관의 재료 또한 일본에서만 난다는 금송이었다. 백제 장인들의 솜씨가 담긴 금속제 장신구는 많았지만 그 흔한 백제 시대 도자기는 단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진짜 무령왕은 외제를 좋아했을까? 무령왕의 일생을 통해 이 의문점을 풀어보자. 우선 그의 출생부터가 ‘국제적’이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무령왕의 아버지인 개로왕이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려 동생 곤지를 특사로 파견했다. 곤지는 명령에 따르면서도 왕의 부인 중 한 명을 달라고 했고, 개로왕은 임신한 부인을 맡기며 “만약 가는 도중 아이를 낳으면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부탁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다. 태어날때부터 국제적 운명 실제로 개로왕의 부인은 가는 도중 진통을 느껴 아이를 낳았는데 이곳이 현재 규슈의 한 작은 섬인 가카라시마다. 무령왕이 살아 있을 당시 이름이 사마대왕인데 ‘사마’라는 뜻 자체가 섬이란 뜻이다. 가카라시마에는 백제 무령왕의 출생지라는 동굴이 있고, 그곳에서 귀한 분이 아이를 낳았다는 등 현지 전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이 무령왕의 출생지로 확실해 보인다. 475년, 그의 나이 13살 때 백제 한성에 고구려군이 들이닥쳤다. 당시 장수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동북정벌에 쏟았던 힘과 노력을 남쪽으로 돌렸다. 백제 임금이던 개로왕은 백성의 삶이나 국방에 큰 상관이 없는 왕궁 확장과 선왕묘의 대대적인 확장 개·보수를 했고, 한반도에서 가장 큰 강인 한강 제방 쌓기 같은 토목공사는 한강에 뿌리박았던 백제 왕권의 힘을 급속히 소진시켰다. 그러니 고구려군이 밀려오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본인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다. 같은 왕족들이 눈앞에서 무참히 살해되자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소년 사마. 아마 이 일로 그는 나라의 국력이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이를 악물며 다음을 기약했을 것이다. 뛰어난 외교력으로 위기 돌파 웅진(지금의 공주)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다. 당시 백제는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태가 아니었다. 웅진으로 피난 온 백제 왕실을 토착민들이 반길 리 만무했다. 툭하면 반란이 일어났고 문주왕과 동성왕이 반란군에 의해 암살당했다. 전대 왕인 동성왕이 포악해 민심이 들끓자 백가를 비롯한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암살한다. 40살의 왕족이던 무령왕은 백가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다(동성왕의 암살 배후에 무령왕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도 있다). 무령왕은 곰곰이 생각했다. 고구려의 끊임없는 도전과 백제의 앞날을 생각했을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우선 본인이 태어난 일본. 작은아버지인 곤지가 특사로 파견돼 있으면서 많은 백제인이 건너가 있었던 왜, 백제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들이라면 자신의 든든한 배경이 돼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중국 양나라. 비록 남북조로 갈라졌지만 문화적 기운은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던 양나라는 위기의 백제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줄 만한 저력이 있었다. 그는 곧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 양국의 관계를 돈독히 했다. 유학과 도교 등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를 정비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한 다음, 일본에 오경박사를 파견해 그 문화를 전해주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백제의 중흥기를 일구었다. 일본 와카야마현 스다하치만신사에 소장된 청동거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다. “계미년 8월 게이타이 천황대에 사마왕(무령왕)이 그의 장수를 염원하여 사람들을 보내 이 거울을 만들었다.” 이 글은 왜왕과 스스럼없이 지내던 무령왕의 외교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무령왕이 외교에 힘쓰며 백성을 사랑하고 국력을 신장하면서 백제는 고구려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거듭났다. 수십 차례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큰 승리도 얻어냈다. 그리하여 왕은 521년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의기양양하게 “누파고구려 갱위강국”(累破高句麗 更爲强國·백제가 고구려를 격파하고 다시 강한 나라를 세웠다)이라고 자랑했다. 어린 시절, 웅진으로 피난 오며 꿈꾸던 강한 백제를 그가 이뤄낸 것이다. 동아시아가 애도하다 선대왕들과 달리 무령왕은 62살 때 노환으로 죽음을 맞이해 천수를 다했다고 전해진다. 서기 523년 무령왕이 죽자 양나라와 일본도 즉시 애도의 뜻을 담아 무령왕의 무덤에 넣을 부장품을 보내왔다. 이미 일본 금송으로 만든 목관은 제작돼 있었고, 양나라의 기술자들은 바다를 건너와 벽돌식 무덤 건축을 도왔으며, 각종 도자기와 물품이 속속 도착했다. 1400여 년 전, 중국 남조-백제-왜 삼국의 기술과 정성, 생전 동아시아의 중심축이던 무령왕의 생애가 고스란히 담긴 것이 바로 무령왕릉이다. 이제야 의문이 시원하게 풀린다. 무령왕은 외국산 명품을 좋아한 왕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교류의 핵을 담당한 시대의 영웅이었다. 요즘 시대의 화두는 ‘소통’과 ‘연대’다.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했고,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국제 감각을 가지고 외교에 주력하면서도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려는 공생의 자세를 가졌던 무령왕은 21세기 지도자 상이 아닐까? 이주연 천안 부성중 교사 |
|||
비운의 명장 흑치상지 부흥군 궤멸시킨 백제의 유장···당에서 승승장구하다 모반죄 몰려 중국 하남성 낙양에 북망산이 있다.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그 누구냐…’라는 <성주풀이>의 낙양성 무덤은 북망산을 뜻한다. 낙양에 도읍했던 중국 여러 왕조 지배층의 귀족 묘지인데, 현재 고묘(古墓)박물관이 조성돼 있다. 그런데 우리와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곳에 뜻밖에도 우리 역사와 관련된 인물이 여럿 묻혀 있다. 1929년 10월 도굴꾼들이 백제의 유장(遺將) 흑치상지(黑齒常之)의 묘지석을 발견한 곳도 북망산이다. 흑치상지는 <삼국사기>는 물론 중국의 <구당서>와 <신당서>에도 열전이 실려 있는 인물이다. 그만큼 파란만장하고 국제적인 인생을 살았음을 뜻한다. ‘흑치’라는 특이한 성씨의 유래가 수수께끼인데 흑치상지 ‘묘지명’은 “그 선조가 부여씨에서 나와서 흑치에 봉해졌기 때문에 자손들이 이를 성씨로 삼았다”라고 적고 있어서 백제의 왕성인 부여씨의 지파(支派)임을 나타내고 있다. <삼국사기>와 <구·신당서> 모두 ‘백제 서부인’이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흑치는 백제의 서쪽 어디쯤으로 유추된다. 임존성 사수하자 3만 병사 모여들어 흑치상지 ‘묘지명’은 “그 가문은 대대로 달솔(達率)을 역임했는데, 달솔이란 직책은 지금의 병부상서(兵部尙書)와 같으며, 본국에서는 2품 관등에 해당한다”고 전한다. 흑치상지의 운명은 백제의 멸망과 함께 파란만장한 인생유전으로 접어든다. ‘묘지명’은 “당 현경(顯慶·656~660) 연간에 당나라에서 소정방을 보내 백제를 평정하자, 그 주인 부여융(扶餘隆)과 함께 입조(入朝)했고, 당나라는 이들을 만년현인(萬年縣人)에 예속시켰다”라고 간단하게 전한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흑치상지가 백제 부흥군의 맹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삼국사기>는 “소정방이 늙은 왕(의자왕)을 가두고 군사를 놓아 크게 노략질하니 흑치상지는 두려워서 측근 무장 10여 인과 도주했다”면서 “(흑치상지가) 무리를 모아서 임존성에 웅거하여 스스로 굳게 지키니 열흘이 못 되어 모여드는 이가 3만 명이나 되었는데, 소정방이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고, 흑치상지는 드디어 200여 성을 회복시켰다”라고 전하고 있다. 백제 부흥군이 기세를 올리자 소정방은 황급히 의자왕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장병 1만3천여 명을 당나라 장안으로 압송했다. 백제 부흥군의 복신·도침 등은 일본에서 귀국한 부여풍(夫餘?)을 임금으로 추대했는데, 흑치상지는 이 세력의 주요 무장이었다. 당나라는 662년 부여융을 당나라 장수 유인궤와 함께 귀국시켜 백제 부흥군에 맞서 싸우게 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백제 부흥군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흑치상지의 운명길이 달라진다. 백제 무왕의 조카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실권을 잡자 풍왕이 복신을 제거한 것이다.  낙양 북망산 고묘 박물관의 경릉. 고구려 여인 문소태후의 아들 북위 세종의 릉. 부흥군 내분으로 당나라 투항 <삼국사기> 흑치상지 열전은 “용삭(龍朔·661~663) 연간에 고종이 사자를 보내 흑치상지를 타이르니 유인궤에게 항복했다”고 전하고 있다. 당 고종이 사자를 보내 타일렀다는 것은 부여융이 흑치상지 회유에 적극 나섰음을 뜻하는데, 백제 부흥군에 서로 죽고 죽이는 내분이 발생했을 때 부여융이 회유하자 흑치상지는 투항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백제 부흥군의 수도인 임존성 함락에 가담해 결정적인 공을 세운다. 흑치상지는 부여융과 함께 당나라로 들어가 절충도위(折衝都尉)를 제수받고, 664년 웅진도독 부여융과 함께 귀국하는데 ‘묘지명’은 “(흑치상지가) 웅진성에 진수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나라의 관점이고, 백제 유민들은 백제 부흥군의 맹장이 당나라 장수로 돌아온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시 당나라로 들어간 흑치상지는 “함형(咸亨) 3년(672)에 공이 있으므로 충무장군(忠武將軍)…과 상주국(上柱國)을 제수받았다”는 ‘묘지명’의 기록처럼 승승장구한다. 그의 공은 대부분 당나라 변방을 공격한 토번(티베트)과 돌궐(투르크)과 맞서 싸운 것이었다. <구당서> 흑치상지 열전에 따르면 그는 당 고종 의봉(儀鳳) 3년(678) 토번이 변방을 공격하자 이경현과 함께 격퇴하러 나섰다. 당군이 진흙 구덩이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 흑치상지가 야밤에 결사대 500명을 거느리고 토번의 군영을 습격해 승리를 거두었다. 당 고종은 흑치상지의 지략을 높이 사 좌무위장군으로 봉하고 금 500냥과 비단 500필을 하사했다. 또한 토번의 찬파와 소화귀 등이 3만여 군사를 이끌고 공격했을 때도 흑치상지는 3천여 기병을 이끌고 야밤에 기습해 토번 2천여 군사의 목을 베고 양과 말 수만 필을 획득하기도 했다. 당 중종 수공(垂拱) 2년(686)에는 돌궐(투르크)이 변경을 침범하자 흑치상지가 다시 격퇴하러 나섰는데, 직접 기병 200명을 이끌고 선봉에서 질주하자 돌궐군이 도주했다. 흑치상지는 밤에 군영에 봉수처럼 불을 질렀는데 마침 동남쪽에서 대풍이 일자 돌궐군은 구원병이 오는 것으로 알고 도주했다고 <구당서>는 적고 있다. 토번과 돌궐 토벌하며 북방 호령 이처럼 서방의 티베트와 북방의 투르크를 진압한 것에 대해 ‘묘지명’은 “오랑캐의 티끌을 숙청하니 변방의 말이 살찌고, 한(漢)의 달이 훤하게 비치게 되어 하늘의 여우 기운이 사라졌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런 공으로 흑치상지는 드디어 연국공(燕國公)의 지위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나 당 중종 수공(垂拱) 3년(687) 돌궐이 삭주를 다시 공격했을 때 대총관(大總管)으로 격퇴에 나선 흑치상지의 운명에 암운이 깃든다. 흑치상지는 황화퇴에서 돌궐군을 크게 격파하고 40여 리나 추격했다. 돌궐군이 흩어져 적북으로 도주하자 중랑장(中?將) 찬보벽이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전군이 궤멸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당서>는 찬보벽이 “흑치상지와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했지만, 찬보벽이 사형당하면서 그도 안심할 수 없었다. 이 무렵 우응양위장군 조회절 모반 사건이 발생하는데 <구당서>에 혹리(酷吏·악독한 관리)로 기록된 주흥이 흑치상지가 여기 가담했다고 무고하면서 흑치상지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신당서> 측천순성무황후(則天順聖武皇后·무측천) 영창(永昌) 원년(689)조는 그해 10월 우무위대장군 흑치상지를 죽였다(殺)라고 기록했다. 사형을 당한 것이다. <구·신당서> 흑치상지 열전과 ‘묘지명’은 스스로 목매 자살했다고 조금 달리 전하고 있다. 10년 후인 699년, 아들 흑치준(俊)은 부친이 누명을 썼음을 밝혀내고 무측천으로부터 좌옥검위대장군(左玉鈐衛大將軍)을 추증받고 묘소도 귀족 무덤인 북망산으로 이장했다. ‘묘지명’은 “천하가 애통해했고, 해내(海內)가 그의 어짐을 애통해했다… 기리는 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명성은 끝이 없을 것이다”라고 끝맺고 있다. 백제 유장이었다가 백제 부흥군 궤멸에 앞장서고 다시 당나라로 건너가 토번과 돌궐 정벌의 공으로 연국공에 올랐다가 끝내 사형당한 흑치상지. 그에게 국가는, 또 역사는 무슨 의미였을까?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
|||
베일의 인물 게이타이, 그가 품은 비밀은? 일본 정사 속 수수께끼 인물… 백제-왜 왕가 관계 규명의 열쇠 백제는 비류(沸流)·온조(溫祚) 형제에 의해 건국됐다. 곰나루에 나라를 세운 비류 세력은 일본 규슈 비(肥) 지역에 분국(구노국)을 세웠다(沸=비=肥=火). 그곳의 에다후나야마 고분에서 많은 백제계 유물이 출토됐다. 최근 충남 공주 수촌리에서 왕후급 수장의 금동장식신, 환두대검, 마구 그리고 중국제 도자기 등 많은 유품이 출토됐다. 이 유품들은 에다후나야마의 것에 버금가는데, 문주왕의 웅진 천도 이전에 상당한 세력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것이 곧 광개토대왕비에 새겨진 ‘이잔’ 세력임이 분명하다. 수촌리의 가라어는 비류가 처음 인천 부근에 나라를 세운 곳 미추홀(彌鄒忽)과 일치한다. 인천에 있던 비류 세력이 곰나루에 자리를 옮긴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다. 진구와 오진 모자 곰나루 세력은 분국 구노의 군을 자기 땅에 불러들였다. 일본 정사에서 진구는 가야계의 마지막 왜국 왕 추아이의 비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실제 그녀는 곰나루 출신이며, 이잔과 구노 연합군의 우두머리였다. 이들은 신라 국경까지 침범했으나 결국 광개토대왕군에게 격파당하고 규슈로 건너갔다. 중국 고대 역사서 <수서>에는 “신라왕의 조상은 백제인이며, 바다로 도망친 뒤 신라로 들어가 신라왕이 되었다”고 쓰여 있으며, 또한 신라왕은 광개토대왕에게 “왜가 국경에 가득하고, 성지를 파기하고 있다”며 구원을 요청한다(<광개토대왕비>). 또한 일본 정사는 이 사건을 진구의 신라 정벌로 묘사하고 있다. 일본 왕가는 ‘만세일계’(万世一系)임을 가장해왔으나, 사실은 가야계·비류계·온조계 3왕조로 이어졌다. 제1왕조는 가야계 정복 왕조였다. 진구·구노 연합군은 제1기 왕조의 마지막 왕 추아이를 규슈에서 전사시키고 기내(오사카)에 혁명 왕조를 수립한 제2왕조다. 곰나루(應津)의 일본 음이 오진(應神)과 비슷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오진 정권이 수립되자 137현의 백성도 일본으로 대규모 민족이동을 감행했다. 이들은 한때 신라의 방해로 신라 땅에 발이 묶였으나, 오진이 군을 보내 기내로 데리고 왔다. 또한 일본 정사는 오진계의 유략왕이 한성 백제가 함락되자 즉시 문주왕에게 곰나루의 영토를 양도했다고 하는데, 오진 왕조가 곰나루 출신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주시 웅진동의 곰나루와 곰굴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연미산.사진 한겨레 자료 백제가 ‘구다라’가 된 까닭 한반도의 고대국가명은 모두 이두 표시지만 가라어의 이름(이두)이었다. 그러나 유독 백제(百濟)만은 처음부터 한자어다. 그 유래는 십제에서 백제로의 성장(<삼국사기>) 또는 ‘백가제해’(<수서>) 등 여러 설이 있는데, 사실은 온조의 이름에서 나왔을 것이다. ‘온’은 가라어의 ‘백’이며 ‘온조 →백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사는 처음부터 백제를 ‘구다라’(큰 나라)로 읽고 있다. 백제는 삼한 최대 국가 마한의 후신이며, 그 분국 ‘구노’도 ‘큰 나라’를 나타낸다. 웅진에서 건너간 진구(오진)·구노 세력이 스스로를 큰 나라, 즉 ‘구다라’라 한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들은 기내에 제2왕조를 수립하자 만세일계의 신화에 따라 제1왕조의 신화와 이름 야마토(倭)를 이어받고 본국의 백제를 ‘큰 나라’라 불렀다. 일본서 태어난 두 백제 왕자 오진은 한국에서 태어날 것인데 어머니 진구가 돌로 배를 눌러 억지로 규슈 해변에서 태어나도록 했다. 똑같은 구도의 이야기가 또 있다. 곤지는 형 개로왕의 명으로 “만일 아들을 낳으면 즉시 백제로 보내기”로 하고 산달이 된 개로왕의 후궁과 함께 일본으로 갔으며, 규슈의 한 섬에서 무령을 낳고 즉시 돌려보냈다고 한다. <일본서기> 같은 역사가가 같은 구도의 두 이야기를 정사에 삽입한 것은 분명히 의도적이다. 이 아리송한 신화들은 공통적으로 백제에서 잉태하고 일본에서 태어난 왕자가 왜와 백제, 두 나라의 왕이 될 운명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오진은 이 인연으로 천지신기(天地神祇)로부터 삼한의 지배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실제 오진 계열인 왜 오왕의 대중국 외교 노선은 이 생각을 따르고 있다. 게이타이와 곤지 오진의 5대손으로 위장한 게이타이(실체는 백제 개로왕의 동생 곤지)가 백제계 호족의 지지로 오진 왕조를 타도하고 항복을 받는 형식으로 왜왕으로 즉위한다(<일본서기>). 일본 정사에 쓰인 게이타이는 출신 배경을 알 수 없고, 즉위한 뒤에도 20년 동안이나 왕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의문투성이의 인물이다. 이는 그에 대해 상당한 반대 세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게이타이(繼?)라는 이름도 ‘체제를 계승한다’는 뜻으로, 쿠데타 왕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게이타이는 왕이 되자 즉각 적극적인 친백제 노선을 취한다. 가야의 땅 일부를 백제에 양도하고 5만 대군으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규슈에 있는 신라계 세력 이와이(盤井)를 섬멸하기도 했다. 곤지에게도 게이타이 못지않게 수수께끼가 많다. 이 두 사람이 동일인임을 감추기 위한 <일본서기>의 위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개로왕의 동생 곤지는 큰치(大人)로, 게이타이의 왜명 오오토(大人)와 같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게이타이(오오토)는 같은 시기 곤지와 함께 가우치(현 오사카)에서 지낸 셈이니, 두 사람은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 개로왕의 동생 곤지에 대한 <송서>(宋書)의 기록에는 차기 백제왕 제1후보인 좌현후로 나오는데, 그 아래 격인 문주왕 때 3개월간 내신좌평(內臣佐平)으로 있다가 죽었다. <삼국사기> <일본서기>에는 곤지가 만삭이 된 왕의 후궁과 함께 왜로 가던 중 규슈의 섬에서 사내아이를 낳았다고 돼 있다. 이 아이가 곧 무령이다. 이때 곤지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명기하고 있다. 무령왕과 곤지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서기>는 부자·숙질·형제 3가지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부자지간이다. 곤지의 아들을 5명으로 명기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게이타이(곤지)가 죽자 그의 태자와 제2왕자가 이상한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왕위를 이은 왕자 긴메이는 처음부터 태자로 기록돼 있다. 이 모순은 왕이 죽자 또 하나의 정변이 일어났으며, 긴메이가 형들을 살해하고 억지 수단으로 왕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곤지의 다섯 아들 중 죽임을 당한 2명과 백제 왕이 된 동성왕, 그의 아우 무령왕, 그리고 긴메이 5명의 실체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처음 곤지의 아들이 다섯이라고 기록한 역사가는 긴메이의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렇게 썼던 것으로 보인다. 긴메이가 게이타이의 아들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이며, 실제로는 아들이 아닐 개연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은 스스로 만세일계의 ‘신의 나라’로 우기지만 곤지와 그의 왕자들이 같은 시기 백제와 왜의 왕이었음은 상징적이다. 천왕은 성씨가 없음을 내세워왔으나 <수서> 왜인전에는 ‘아마’씨로 돼 있다. 백제 왕성 ‘여’(余)는 일본어로 아마(리)로, 백제와 왜는 동성동본이다. 김용운 단국대 석좌교수 |
|||
또 하나의 역사, 백제 문화재 수난사 일제의 고의와 개발독재의 무지… 찬란했던 만큼 상처도 깊어  1971년 무령왕릉 발굴 당시 조사단이 목관을 반출하고 있다. 충남 공주와 부여에는 웅진·사비 시대의 주요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유적은 14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상처를 입어왔다. 공주·부여·익산에 남아 있는 백제 문화재의 상처를 짚어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공주시 금성동에 자리한 송산리 무덤군은 복원된 7기 무덤을 포함해 모두 20기 이상의 백제 무덤이 있는데, 무령왕릉이 발견됨으로써 이 무덤군을 비롯해 주변 지역이 왕릉급 무덤이 자리했던 곳임이 밝혀졌다. 고분은 표고 130m의 송산을 북쪽의 주산(主山)으로 한 남쪽 경사면에 분포하며, 구릉 윗부분의 1∼4호분이 한 그룹, 그 남쪽 사면에 무령왕릉과 5~6호분이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 중에 벽돌무덤인 무령왕릉과 6호분을 보건대 웅진 시기 초창기의 횡혈식 석실분이던 왕실묘가 남조의 영향으로 벽돌무덤으로 전환됐음을 알 수 있다. 공주 지역의 많은 백제 무덤들을 일본인 가루베 지온이 처음 발견해 조사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은 가루베를 발굴자로 알고 있지만, 가루베는 조선총독부의 허가 없이 비공식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도굴자라고 할 수 있다. 고고학자 탈을 쓴 일제 도굴범들 공주 지역 고분에 대한 학술조사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노모리 겐 등이 1927년 송산리 무덤군 5기를 조사한 것이 효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무덤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도굴됐고, 송산리 1호분의 경우 1927년 고분 인근의 주민이 도굴 구멍을 뚫어 잔존하던 부장품을 모조리 훔쳐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1933년 8월 초 송산리 6호분의 벽화고분이 발견되자 조선총독부는 후지타 료유사쿠가 이끄는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에 앞서 1932년 가을 송산리 무덤군 내부를 통과하는 관람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해 10월26일 6호분인 벽돌무덤의 배수구 일부가 발견됐다. 당시 공주고보 교사인 가루베는 이런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도 않고 1년 가까이 배수구를 파 들어가 이 무덤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1년 뒤 이 사실을 총독부에 알렸다. 공주 송산리 6호분에 이르는 통로를 개설하다 새롭게 발견된 29호분은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아리미쓰 교이치와 고이즈미 아키오 등이 조사했다. 먼저 29호분을 발견한 가루베는 1933년 여름 송산리 6호분을 지나는 왕릉관람도로에서부터 분기점을 뚫고 가다 커다란 석재의 일부를 발견했다. 그는 이 석재를 조금씩 노출시키다 널길(연도·羨道, 고분의 입구에서 주검을 안치한 방까지 이르는 길)의 천정석을 찾아내 마침내 본 석실을 파헤치게 된다. 이때 그 안에 있던 허리띠와 귀고리 등은 행방이 묘연하다. 정식 조사는 1933년 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됐다. 송산리 무덤들의 발굴 과정을 볼 때 가루베는 무덤의 약탈자임이 틀림없다. 하룻밤만에 끝난 무령왕릉 조사 발굴 백제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한국의 문화재 전문가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1971년 7월 발견된 무령왕릉에서는 108종 2906점이란 엄청난 양의 유물이 출토됐다. 그러나 백제사 연구에 큰 전환을 가져온 중대한 발견인데도 무덤 내부의 조사를 불과 12시간 만에 마무리해 발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역사적 사실을 놓치고 말았다. 발굴 당시 주변의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지만, 한국 고고학계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과오라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발굴을 시작하기 전인 6월 말 문화재관리국은 5호분과 6호분의 배수로 작업을 했다. 배수구를 만들기 위해 봉토의 일부를 파 들어가던 7월5일, 배수구 한쪽에서 작업하던 인부의 삽자루 끝에 봉토와는 다른 딱딱한 물체가 닿았다. 조심스레 그쪽을 파내려가다, 6호분에서와 비슷하게 가지런히 쌓은 벽돌들이 나타나자 인부들은 현장에 나와 있던 문화재관리국 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인 김원용 박사를 단장으로 조사단이 구성됐다. 7월7일 오후 4시 김원용 단장의 도착과 함께 그동안 멈췄던 작업이 재개됐고, 벽돌로 쌓아올린 부위가 점차 넓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윽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널문의 가장자리 윤곽에서 둥그스름하게 쌓아 돌린 벽돌들이 나타난 뒤 조금 더 내려가 막음벽돌로 채워진 널문의 실체가 드러났다. 발굴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폭우가 내려 조사 작업은 중단됐고, 계획된 야간 작업도 취소됐다. 7월8일 오후 4시쯤 간단히 제수를 준비해 조사단 대표와 현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위령제를 올린 뒤 4시15분쯤 드디어 널문을 막아둔 벽돌의 개봉에 들어갔다. 무덤에 가장 먼저 들어간 김원용 관장은 20분 뒤 밖으로 나왔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단장인 김원용 관장이 나섰다. 우선 이 무덤의 주인공은 백제 사마왕(斯麻王), 즉 제25대 무령왕 부부라는 것과 이것을 적은 지석(誌石)의 존재, 그리고 이 무덤은 이전에 도굴이나 발굴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밝혔다. 이후 밤 10시께 본격적으로 조사해 유물을 실측하고 반출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촬영기자들이 반출되는 중요 유물과 무덤 내부의 촬영을 막무가내로 하는 분위기에서 조사는 차분히 진행될 수 없었다. 무분별한 개발… 묻히거나 떠돌거나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눈에 띄는 유물만 실측했고 작은 유물들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청자육이호를 시작으로 지석과 진묘수(무덤 속에 놓아두는 신상) 등이 반출됐다. 7월9일 아침 날이 밝아오자 작업은 막바지로 향했다. 바닥에 깔린 유물들은 풀뿌리와 함께 큰 삽채 거둬 자루에 담겨 나갔다. 오전 9시께 모든 작업은 종료되고 발굴단은 철수했다. 제대로 했다면 족히 몇 달은 걸렸을 작업은 이렇듯 하룻밤 새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도 백제 문화재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교촌리 고분군은 공주시 교동에 자리하고 있던 고분군으로, 벽돌무덤 2기와 돌방무덤 4기가 확인됐다. 교촌리는 공주의 중심부에서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에 이르는 중간부에 위치한 구릉지대이지만, 공주가 도시화하면서 구릉의 대부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고분군은 공주의 백제 시대 고분군이 거의 그러하듯, 1930년대 가루베에 의해 조사됐다. 그러나 1972년 가루베의 책 <백제 유적의 연구>에서는 돌방무덤 1호와 4호, 6호분과 벽돌무덤 3호만 기록됐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공주 교촌리 출토품으로 알려진 귀고리 2점이 소장돼 있다. 공주시 제민천변 부근의 반죽동에는 527년(성왕 5) 창건된 대통사지가 있다. 공주대 박물관에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발굴했지만, 이미 건물이 들어선 환경 때문에 정확한 규모 등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현재의 사역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당간지주가 있다. 당간의 두 지주는 동서로 마주 보고 서 있으며 기단부 파손이 심한데, 그 하단부는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손됐다고 한다. 지금의 국립공주박물관 야외 정원에는 대통사지에 있던 석조 2점이 전시되고 있다.  1930년대 대통사지 석조 공주 반죽동석조(보물 제149호)가 반죽동 대통사지에서 바로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옮겨온 데에 비해, 중동석조(보물 제148호)는 일제시대 일본군이 말 먹이통으로 쓰기 위해 중동으로 옮겨가 1940년 공주박물관으로 옮겨올 당시까지 보관했다. 그래서 이름도 ‘중동석조’라 부르게 되었다. 대통사지에 있는 2점의 석조는 백제 멸망 이후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다 일제강점기에 원래 자리를 떠나 떠도는 신세가 된 것이다.  ①1910년대 정림사지와 5층 석탑 ②1933년 송산리 6호분 전경 ③1917년대 나성 동문지 전경 일제의 고의적 파괴 행위 토기와 기와를 제작했던 부여 쌍북리 가마는 1941년 5월 부여 시가지 계획도로 공사 중에 발견됐다. 당시 총독부박물관 부여분관에서 총독부박물관에 보낸 자료를 보면, 1941년 5월27일 부여 시가지 계획도로 공사 중에 ‘보릿고개’ 동쪽 도로 절개 부분의 땅밑 1.8m 지점에서 가마유구와 함께 기와와 토기 조각들이 발견됐다. 가마는 35도의 경사를 이룬 등요(登窯)로 길이 8m, 아궁이 높이 72cm, 바닥은 계단식이다. 이 유적은 외곽도로 건설과 함께 금성산의 혈맥을 절단해 조선의 기를 없애려는 일제의 의도에 의해 완전하게 파괴돼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다. 부여 정림사지와 5층 석탑은 부여 읍내 중심에 있는 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중 하나로, 현재 5층 석탑과 고려 시대의 석보불상이 남아 있다. 이 절터는 서기 1028년에 재건한 사실과 절의 이름이 ‘정림사’였음이 1942년 발굴 조사 때 출토된 ‘대평팔년무진’(大平八年戊辰)명 고려 시대의 암키와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1979∼80년 충남대 박물관 조사에서 이 절의 가람 배치가 중문·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한 일탑일금당식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절터에서는 납제삼존불과 소조불·도용·벼루 등이 출토됐는데, 도용은 백제가 중국 북위와 활발히 문물을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높이가 8.33m에 이르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계보를 정립하는 데 귀중한 유적이다. 전체적인 구조는 지대석을 놓고 기단부를 구성한 다음 그 위에 5층의 탑신부를 놓고 정상에는 상륜부를 뒀다. 초층탑신의 4면에는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과 함께 소정방의 공적이 빽빽이 음각돼 있어 이 탑을 예전에는 평제탑(平濟塔)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건립 시기를 660년대로 추정하기도 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멸망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대표적인 유물이다. 당나라 군대, 백제 석탑 훼손 현재 국립부여박물관 중정에 전시된 부여석조(보물 제149호)는 원래 부여 동헌 건물 앞에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 때 부여 관북리 옛 국립부여박물관 뜰로 옮겼다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것이다. 석조 일부에 정림사 5층 석탑에 새겨진 것과 같이 당이 백제를 평정했다는 뜻을 새기다 그만둔 흔적이 확인된다. 부여석조는 정림사지 5층 석탑과 함께 백제 멸망의 아픈 흔적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사비 백제의 유물이다. 능산리 무덤군은 총 7기의 고분이 있다. 이 무덤군은 백제 사비 시대의 왕릉으로서 능산리 산등성이에 위치하며, 부여 나성의 동쪽 부분 바로 밖에 있다. 고분의 외형은 원형 봉토분으로, 내부 구조는 널길이 달린 횡혈식 석실분이다. 고분 내부 형태는 터널식, 단면 4각형, 단면 6각형이다. 이 무덤군은 청마산성이 위치한 청마산의 남향 사면 끝에 있는데 입지 환경으로는 백제 횡혈식 석실의 전형적인 형식을 보여주며, 이 고분군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도 고분군이 있다. 이 고분군은 1914년 야기 쇼자부로에 의해 그 존재가 알려졌는데, 1915년 조사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위촉을 받은 도쿄제국대 구로이타 가쓰미와 세키노 다다시에 의해 2·3·5호분이 조사됐고, 3년 후인 1917년에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이던 다나이 사이아치, 오가와 게이키치 등이 1·4·6호분을 조사했다. 1937년 능산리 동고분 지역 발굴과 1960년대 중반 복원 작업 중 발견된 7호분 등을 종합하면 능산리 고분군에는 백제의 횡혈식 석실분이 14기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현재는 7기만 복원 정비돼 있다. 일제에 의한 발굴과 매우 소략한 보고, 광복 이후 무계획적인 복원 정비 작업 결과 일제강점기 때 확인된 고분 중 일부는 훼손되거나 파괴돼 지금은 고분의 정확한 형체를 파악할 수 없게 됐다. 부여 나성은 부소산성을 기점으로 동남쪽으로 우회하는 한 갈래와 서남쪽으로 도는 한 갈래가 있다. 동남쪽 나성은 길고 서남쪽은 짧다. 전체 길이는 약 8km에 달한다. 남쪽은 백마강에 면하고 있어 나성이 축조되지 않았으며 내부에는 부여 읍내와 금성산, 그리고 적잖은 면적의 농경지가 포함된다. 콘크리트 뒤집어쓴 미륵사지 석탑 나성은 구릉을 이용해서 축조됐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동쪽 나성은 높은 구릉 위에 위치하고 서쪽 나성은 백마강을 따라 통과하는 부분이 3곳이 있는데, 지금은 시가지 개발과 농경지 조성으로 평지 나성은 모두 파괴·멸실됐다. 그러나 구릉에 축조된 나성은 옛 모습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부소산성의 좌우 양편은 구릉의 능선을 이용해 축조됐지만, 동북쪽 모서리에는 청산성을 경유해 동남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 출입문으로 동문과 서문이 있다. 서문지로 추측되는 곳은 백제대교 지점 가까이에서 발견됐다. 문지의 외부에는 호안석축이 축조돼 그 높이가 1.5m가량 되며 장방형 석재를 사용해 정연하게 축조됐다. 현재 나성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 있는 동문지의 경우 부여군에 의해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나당 연합군에 의한 훼손과 일제강점기의 부여∼논산 간 국도 건설 등으로 완벽한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익산시 금마면에 창건된 백제 최대의 사찰로, 현재 경내는 석탑과 당간지주 등의 유적이 남아 있다. 1980년부터 진행된 발굴 조사 결과 3탑 3금당식의 가람 배치가 확인됐다. 그리고 이 석탑은 한국에 남아 있는 석탑 중에서 규모와 양식 면에서 가장 고식(古式)이다. 탑의 높이는 14.24m로 화강암 재질의 평면사각형석탑이다. 서남쪽 부분이 무너져 지금은 동북쪽 6층까지만 남아 있으나, 동탑지 주변에서 노반이 발견돼 9층탑이었음이 밝혀졌다. 1층 탑신은 3칸 4면이 평면이고 중앙칸에는 사방에 문이 마련돼 안으로 통하게 돼 있다. 이 탑은 각 부분이 깎은 돌로 따로 구성되며, 그 가구수법(架構手法·물건을 만드는 기법)도 목조건물을 충실히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석탑 이전에 목탑이 선행됐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다.  1920년대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은 1400여 년의 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6층 일부만 남아 있던 것을 더 이상의 붕괴를 막기 위해 1915년 콘크리트를 발라 흉물스러운 모습이 됐다. 그 후 2001년에는 석탑 석재의 강도가 약해지고 콘크리트가 여러 군데 부서지면서 석탑의 해체·복원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2009년 1월14일 석탑을 해체하던 중 석탑의 심주석에서 발원자를 기록한 명문 금판과 금제 사리호가 출토돼, 백제 무왕의 아내인 사택적덕의 딸이 석탑을 창건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콘크리트가 발라진 비운의 백제 석탑의 조성자가 해방 뒤 콘크리트 제거 작업 과정에서 밝혀진 셈이다. 이렇듯 백제 문화재의 수난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역사다. 정상기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실장 |
 미륵사지 사리 장엄구 |
||
 정림사지 5층석탑  근초고왕 혹은 근구수왕 무덤으로 추정되는 서울 석촌동 3호분 |
|||
추가 기사들 ● 망각을 되살리고 현대에 재현하려면 ● 4대강 사업은 백제 문화 반달리즘 ● 대백제전에서 아시아를 보라 ● 세계대백제전 후회 없이 즐기기 ● 21세기에 재현하는 영광의 백제 ● 강추! 이 프로그램 ● 백제전을 국가대표 관광자원으로 |
|||
'History > 삼국시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상왕 장보고 (0) | 2010.09.28 |
|---|---|
| 9. 관산성전투의 재구성을 마치며 (0) | 2008.10.06 |
| 8. 관산성 전투의 여파 - 대가야의 멸망과 왜왕의 절규 (0) | 2008.10.06 |
| 7. 관산성 전투의 재구성 (2) | 2008.10.05 |
| 6. 관산성 전투 당시의 신라 백제의 산성 분포 (0) | 2008.10.05 |
| 5. 신라가 백제의 한성 옛 땅을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었나? (0) | 2008.10.05 |
| 4. 신라의 숨은 명장 이사부와 거칠부 장군. - 신라군의 기반을 닦다 (0) | 2008.10.05 |
| 3. 관산성 전투의 전초전 도살성과 금현성 전투 (0) | 2008.10.05 |
| 2. 신라와 백제의 국운을 건 격전지 관산성 현장답사기 (0) | 2008.10.05 |
| 1. 신라와 백제의 국운을 가른 관산성전투 (0) | 2008.10.05 |